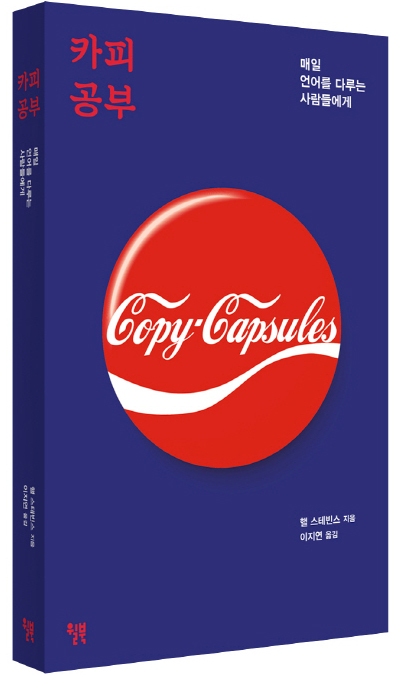광고판에 들어가면 굶어 죽는다는 엄마의 등짝 스매시에도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을 떠돈 지도 3년이 넘었다. 여기서 질문. 직업으로 광고를 한다는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많은 정의가 존재하겠지만, 무엇보다 광고주와 고객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광고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이 업계에서 내 역할은 분명하다. 광고주는 자신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바가 매력적으로 노출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리한 고객은 ‘광고의 냄새’를 맡자마자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객의 구미에 맞게 유쾌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나? 꼭 그렇지도 않다. 지나치게 고객 친화적인 광고는 광고상품의 가치를 갉아 먹을 수 있다.
덕분에 나는 광고주에게 기획서를 거부당하거나, 혹은 고객의 비난을 감수하고 광고주의 의견에 따라 결과물을 강행하는 일을 매일 같이 반복하곤 한다. 둘 사이의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난해한 일이다. 어찌하면 둘 모두를 만족시킬 광고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죽지 못하고 밤새 고민에 시달리는 마감 전날의 밤, 언제나 펼쳐보는 책이 있다. 외과 의사 출신의 전설적인 카피라이터인 핼 스태빈스(Hal Stebbins)이 쓴 『카피 공부』라는 이름의 책이다.
광고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은 단순히 카피를 쓰는 법을 포함하여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자세, 나아가 광고를 넘어 인간을 이해하는 법까지 모든 직간접적인 조언을 담고 있는 필독서이기 때문이다.
핼 스태빈스의 53번째 조언
논리도 좋고, 수학도 좋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학으로 물건을 사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물건 판매도 간단한 산수였을 것이다.
“의뢰인이 부탁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의뢰인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다.”
글에 들어가는 삽화를 담당할 때였다. 늦은 시간 잔디밭에 앉아 있는 가족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광고주는 회신 메일을 통해 ‘어둡지만 칙칙하지 않은 느낌’을 그려올 것을 요구했다.

이미 그림이 어둡다고 말을 했지만, 광고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림의 채도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일러스트레이터도 그 요청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의뢰에 따르는 것이라는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요청을 강행했다.
핼 스태빈스의 932번째 조언
소비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과 의뢰인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별개다. 전자는 좋은 광고 전략이다. 후자는 좋은 ‘전략’일 수는 있으나 좋은 ‘광고’일까?
결과는 민망했다. 홍보 채널에 올라갔던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비슷한 콘텐츠를 작업할 일이 생겼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광고주에게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를 물어봤다.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그건 그쪽에서 제안할 내용 아닌가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어느새 나는 광고주의 요청에 그대로 따르는 무능함을 보였던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예전의 아픈 실패도 반성하게 되었다. ‘어둡지만 칙칙하지 않은 느낌’의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내가 조금만 더 확신을 가지고 광고주를 설득했더라면,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테니 말이다.
핼 스태빈스의 928번째 조언
때로는 의뢰인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똑똑한 방법이다. 어쩌면 놀랍게도 의뢰인은 그 아이디어를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우리는 광고주가 대중에게 호소하는 광고에 용기를 내주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광고주에게 호소할 때 똑같이 용기를 내보지 않는가?
“소비자는 내 메시지의 농담(jest)이 아니라 요점(gist)을 알고 싶어 한다.”
정치 관련 광고를 청탁받은 적이 있다. 특정 발언에 대한 옹호가 요지였다. 조사한 결과, 생각보다 할 말이 없었다. 논문이나 연구서를 인용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했고, 심지어 비슷한 발언을 했던 사례도 없었다.
마감에 쫓긴 나머지 선택한 건 ‘개드립’이었다. 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어와 함께 관련 메시지를 ‘퉁’ 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무척이나 게으른 결정이었고, 그것은 결과로 바로 나타났다. 반응이 없었다. 심지어 악플조차 달리지 않았다.
핼 스태빈스의 879번째 조언
훌륭한 광고는 광고 자신의 수명보다 소비자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진다. 기억하라. 소비자는 소비자 스스로에게 더 관심이 있다.
생각해보면 재미는 부차적인 것이다. 차라리 정직한 접근이 필요했다. 그 발언에 대한 의도를 정면으로 부각하고, 그것이 고객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다음, 거기에 따른 찬반 의견을 모았더라면 적어도 유의미한 콘텐츠로 기능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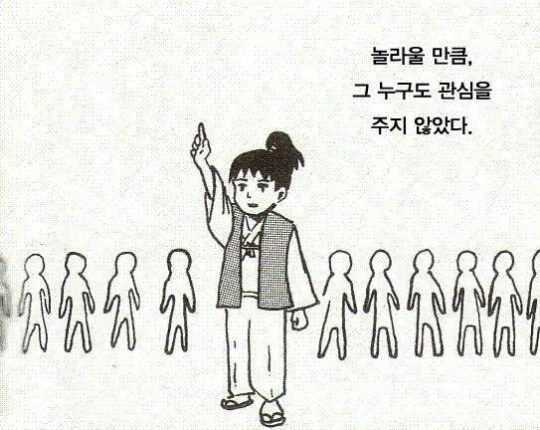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 콘텐츠를 본다는 것은 단순한 말장난을 보기 위함이 아니지 않던가. 차라리 재밌는 걸 보고 싶다면 유튜브를 뒤적거렸겠지.
핼 스태빈스의 796번째 조언
소비자가 내게 귀를 기울일 만한 무언가를 줘야 한다. 시간을 낼 가치가 있게 만들어줘라. 소비자가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라도 좋은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라.
모든 것이 광고인 시대, 우리 모두 ‘카피 공부’를 하자
이 책이 관련 직종자에게만 도움이 된다면, 나는 아마 이 책을 절대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같은 영역에 종사하는 경쟁자들이 읽지 않았으면 하는 책이기도 하고. 이렇게 훌륭한 광고 수업은 그 어떤 명사에게도 듣기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굳이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하는 까닭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광고’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이에게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연애편지를 쓰는 순간에 우리는 모두 고객 앞에 서게 된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핼 스태빈스의 위대한 조언을 기억해보자.
핼 스태빈스의 132번째 조언
‘제품’보다는 ‘예상 고객’과 가까워지는 게 중요하다. 제품에 관해 영리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려면 제품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았다는 수사는 소용이 없다. 이 편지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에 필요한 것으로 써 내려가는 ‘카피’가 연모하는 이에게 닿는 순간,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원고료를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SNS에 남기는 말도 그렇다. 생각해보면 팔로워라고 불리는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던가. 그것을 진행하기 앞서, 위대한 광고인의 조언에 집중하도록 하자.
핼 스태빈스의 688번째 조언
똑똑한 옥외광고업자는 자신이나 가족, 조수들에게 광고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관객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대중들, 현금을 지불할 고객들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이다.
단순하게 자기의 상념을 남기는 글은 SNS라는 무대에 적합하지 않다, 짧은 문장으로 보다 더 좋은 카피를 연주하기 위해 애쓰는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광고주를 이해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필요한 말을 전달하는 광고적 사고는 우리 삶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의 일 대부분은 일종의 ‘카피 쓰기’가 아니던가.
그러니, 이 책을 읽자. 광고계의 전설 핼 스태빈스가 말하는 1060개에 달하는 조언 중에 한 개 정도는 당신 가슴에 ‘콱’하고 분명히 파고들 것이다.
핼 스태빈스의 26번째 조언
인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광고의 심장을 이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