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사장을 읽는다는 것
얼마 전, 책을 소개하는 모 팟캐스트 방송에 녹음을 다녀왔다. 진행자도 PD도 싱글벙글, 유난히 기분이 좋아보였다. 인기 순위가 갑자기 많이 올라서 전체 10위권이 되었다고 했다. PD는 나에게 “지난주에 채사장이 다녀갔어요.”하고 말했다.
뭐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내가 그 올라간 순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다음에 나올걸…’하고 괜히 억울해지는 것이었다.

채사장, 필명이 ‘사장’이다보니 채사장 작가/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다. 그는 내가 아는, 가장 많은 사원들을, 아니 독자들을 거느린 작가 중 하나다.
『지대넓얕』이라는 책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다. ‘많이’ 읽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는 거기에 ‘잘’ 전달하는 재주를 가졌다.
많이 읽고, 스스로 성찰하고, 타인에게 전달한다. 사실 대개 누구나 그렇듯 채사장 역시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신간 역시 그렇다. 그보다 덜 유명한 이들을 통해 이미 반복되어 온 서사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 새로움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채사장의 인지도와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가 가진 필요한 내용을 편안하게 전달하는 능력 때문이다.

채사장을 읽는다는 것은, 이미 말해진, 그러나 누군가 친절히 말해주지 않은 ‘우리가 알아야 할 무엇’과 만나는 일이다.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에는 40여 편의 짧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채사장 본인의 경험이기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서사이기도 하고, 개념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다. 그것이 타인, 세계, 도구, 의미, 라는 순차적인 각각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이런 재미없어 보이는 주제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며, 결국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기에 이른다.
2. 타인과의 만남은 ‘감내’와 ‘잠식’
성급하게 답하자면, 우리는 만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만남이라는 것은 없다. 채사장에 따르면 타인과의 만남은 ‘놀라운 사건’이다. 그는 초반에 많은 지면을 들여 사랑하는 이들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 서술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를 안는다는 것은 나의 둥근 원 안으로 너의 원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감내하는 것이며, 너의 세계의 파도가 내 세계의 해안을 잠식하는 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내가 가진 원에 다른 사람의 원이 침투하는 것은, 몹시 아프고 짜증나는 일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그것은 ‘감내’라는 단어 말고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 몹시 혐오하는 어떤 행위를 내가 사랑하는 그가 즐겨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하고 나면, 어느 새 그 행위를 따라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 그것은 말하자면 ‘잠식’이다. 감내와 잠식이라니, 이만큼 타인과의 만남을 잘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을까, 싶다.
나는 편안한 사람 앞에서는 어떤 놀랄 만한 일이 있으면 “핫…”하고 의성어를 내는 버릇이 있는데, 이전에 서로 깊이 사랑했던 A는 나에게 “그게 뭐야, 엄청나게 없어 보이니까 제발 그만 둬.”하고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는 나의 말에 “핫”하고 반응했다가, “나 미쳤나봐…”하고 얼굴을 감싸 쥐고 말았다.
사랑하는 이들의 언어는 닮아간다. 나는 그에게 “응, 미쳤나봐.”하고 답했는데, 그건 A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었다.

감내하고 잠식해 가면서, 두 사람의 해안은 점차 넓어져 간다. 채사장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타인을 이해하는 ‘지평’이 넓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3. 세면대를 잡고 울어 본 적이 있는가
“헤어짐이 반드시 안타까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실패도, 낭비도 아니다. 시간이 흘러 마음의 파도가 가라앉았을 때, 내 세계의 해안을 따라 한번 걸어보라. 그곳에는 그의 세계가 남겨놓은 시간과 이야기와 성숙과 이해가 조개껍질이 되어 모래사장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고 있을 테니.”
뜨겁게 사랑하던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영원할 것으로 믿었다. 정확히는 영원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만남은 가치가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헤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역설적으로 헤어지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를 읽으면서, 나는 나와 고작 두 살 차이가 나는 채사장이 인생의 어느 비슷한 시점을 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 헤어짐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이 한 사람의 ‘지평’을 넓히고, “운명처럼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날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때는, 아주 오랫동안 우울했다. 채사장은 ‘세면대를 잡고 울어본 적이 있는가’하고 묻지만, 나는 머리를 감다가도 울었고, 버스에 앉아 있다가도 울었고, 잠을 자기 위해 누우면 심연이라고 해도 좋을 곳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것 같아 다시 울었다. 이렇게 끝내 버린 관계에서 무엇이 남을까, 하고 나와 너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해 버린 심정이 되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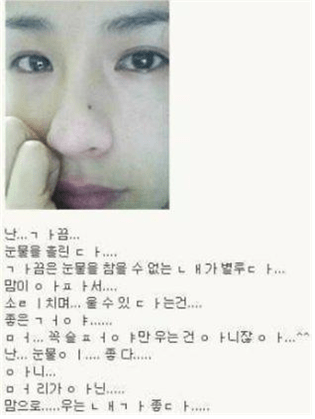
“그의 세계는 나의 세계 위에 온전히 남는다. 나의 세계는 넓어지고 두터워지며, 그렇게 나는 성숙해간다.”
채사장은 서로의 세계가 넓고 두터워지고, 그것은 성숙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조금 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지평을 넓혔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는 타인을 찾기 위한 여행의 어느 도중에 만났다. 그래서 다시 여행을 시작한 너도, 나도,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세계를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했나 봐.”하고 말할 누군가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누군가 역시, 다시 ‘너’라고 부를 만한 누군가를 위한 만남이었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얼마 전 한비야 씨가 네덜란드 출신의 긴급구호 전문가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60과 66, 두 사람의 나이다. 걸어서 지구를 세 바퀴 반을 돌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동안, 어쩌면 한비야 씨는 그와 만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는 만난다.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선언은, 어디엔가 존재할 너와 내가 만남이라는 각자의 여정을 거치며 결국 만나게 되리라는 믿음이다.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우리는,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반드시 ‘연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나는 무엇인가?’라는 흔한 질문
책의 결론에 이르러, 채사장은 “나는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하고 스스로 “나는 관조자다.”하고 답한다. 자신을 하나의 세계로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 그것을 우리는 ‘관조’라고 한다. 명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다.
타인을 이해하는 일은, 자기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나는 무엇인가?”라고 묻고 답을 한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하는 질문은 반드시 “너는 무엇인가?”하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다시 “우리는 무엇인가?”하는 범위로 확정된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타인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채사장의 그러한 태도는, 그의 다음을 궁금하게 한다. 우리가 언젠가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가 이제 어디로 확장될지, 그를 지켜보는 독자로서 기대를 보낸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운명처럼 만나게 된 당신 앞에서 잠시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책을 떠올리게 될 것 같다. 아마도 나를 이해하는 여정의 편도쯤을 끝낸 시점이 아닐까, 한다. 이 책을 읽을 모두에게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