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금. 우리는 비록 카스를 마시지만, 마음만은 뮌헨 옥토버페스트에 가있다. 그렇다. 맥덕들에게 독일이란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한 고향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인지 가끔 이런 문구가 쓰인 맥주를 마주친다. “이 맥주는 독일 맥주순수령을 준수했습니다” 이 마법의 문구는 독일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맥주도 정통, 원조, 프리미엄, 도이치 맥주로 둔갑하게 만든다.
하지만 거칠게 말하면 맥주순수령을 준수했다는 말은 “저희 맥주는 최소한의 재료로 균일한 맛의 맥주를 마구마구 낼 겁니다’에 가깝다. 적어도 독일 밖에서는 그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다.
지난번에는 독일 최대의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맥주 떨이행사였다고 말한 마시즘. 오늘은 맥주순수령이다. 이쯤 되면 독일 입국 금지각. 하지만 그럴 줄 알고 비행기 탈 돈을 모두 맥주에 쏟았다. 바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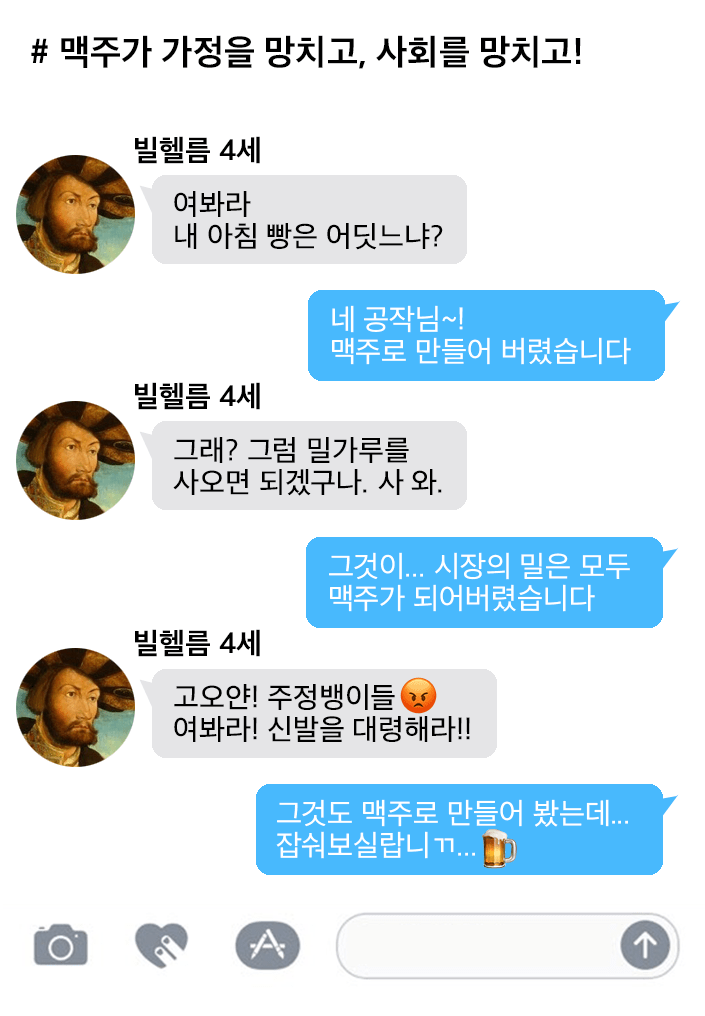
시간을 돌려보자. 1516년. 독일은 어째서 물보다 맥주를 많이 마셨을까? 사실 그 시대에 안전한 수분 섭취는 물보다는 알콜이다. 또한 독일은 농사를 하기 좋은 기후가 아니어서 가축을 길렀고 소시지를 주식으로 먹었다. 소시지에는 당연히 맥주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김장하듯 맥주를 빚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만드는 게 함정. 빵을 만들어야 하는데 밀이 없다. 맥주를 만드느라. 가끔은 신나서 삶은 달걀이나 뱀껍질, 독초로도 맥주를 만드는 이도 있었다고. 누가 죽이는 맛을 내라고 했지, 죽이는 맥주를 만들라고 했던가. 독일 남부 바이에른 공국의 헤어보그 빌헬름 4세는 명령을 내린다.
“야 앞으로 맥주는 보리, 홉, 물만 써서 만들어라.” 일동 시무룩. 이것이 맥주순수령의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 식품위생법의 탄생이다. 하지만 맥주에 들어가는 재료와 양조과정을 국가가 통제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역시 맥덕국에서는 맥주를 통제하는 게 바로 힘이다.
특히 보리는 바이에른 공국에서 독점으로 생산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 밀이나 옥수수 대신 보리로만 맥주를 만드는 것은 곧 나라의 재정을 채워주는 일이다. 맥주의 품질도 적당히 유지하며, 호주머니도 채울 수 있다니 좋지 아니한가. 비록 개성 있는 맥주들이 깡그리 사라졌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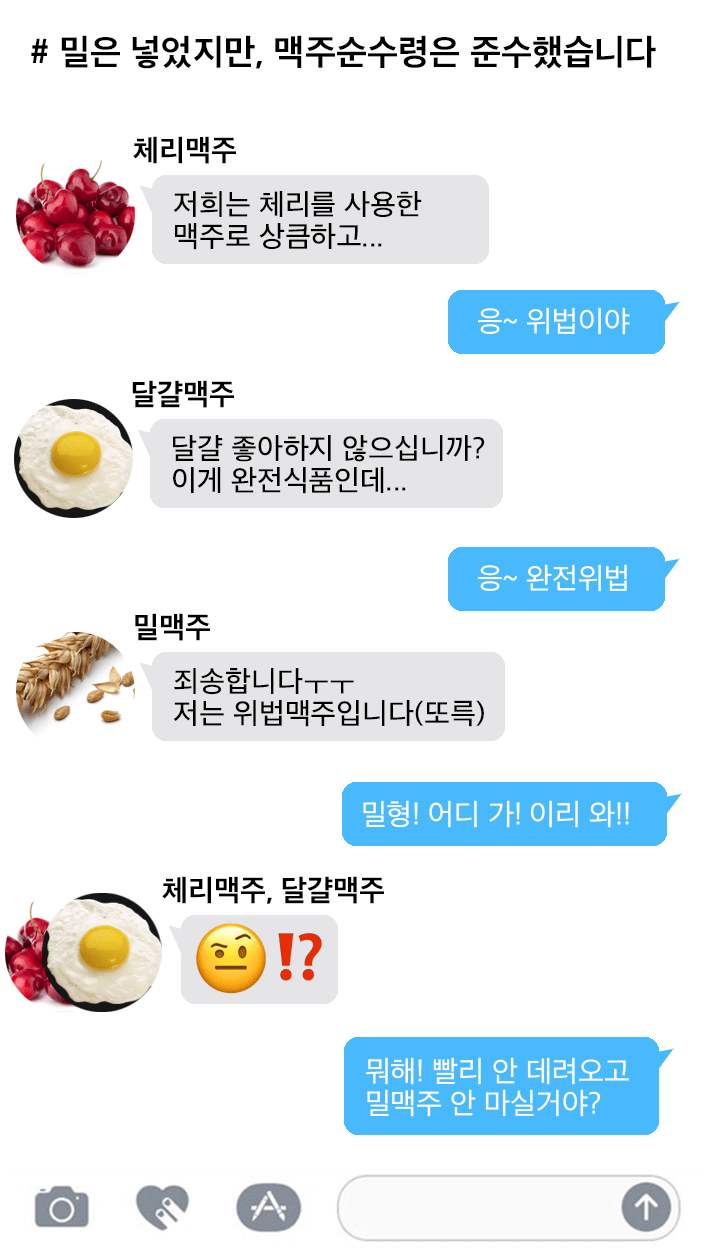
하지만 단 하나. 밀맥주(바이젠 혹은 바이스비어라고 부른다)는 예외였다. 보리가 아닌 밀을 넣었기 때문에 맥주순수령에 위배되는 역적 같은(?) 맥주지만 서민이 아닌 귀족들이 즐기던 맥주였기 때문이다. 맥주순수령과 상관없이 독일의 귀족들은 밀맥주를 마신다. 무전 걍맥. 유전 밀맥.
밀맥주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바이에른 공국은 한 곳. 데겐베르거 가문에만 밀맥주 양조를 허가한다. 대신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세금이 늘 최고야. 짜릿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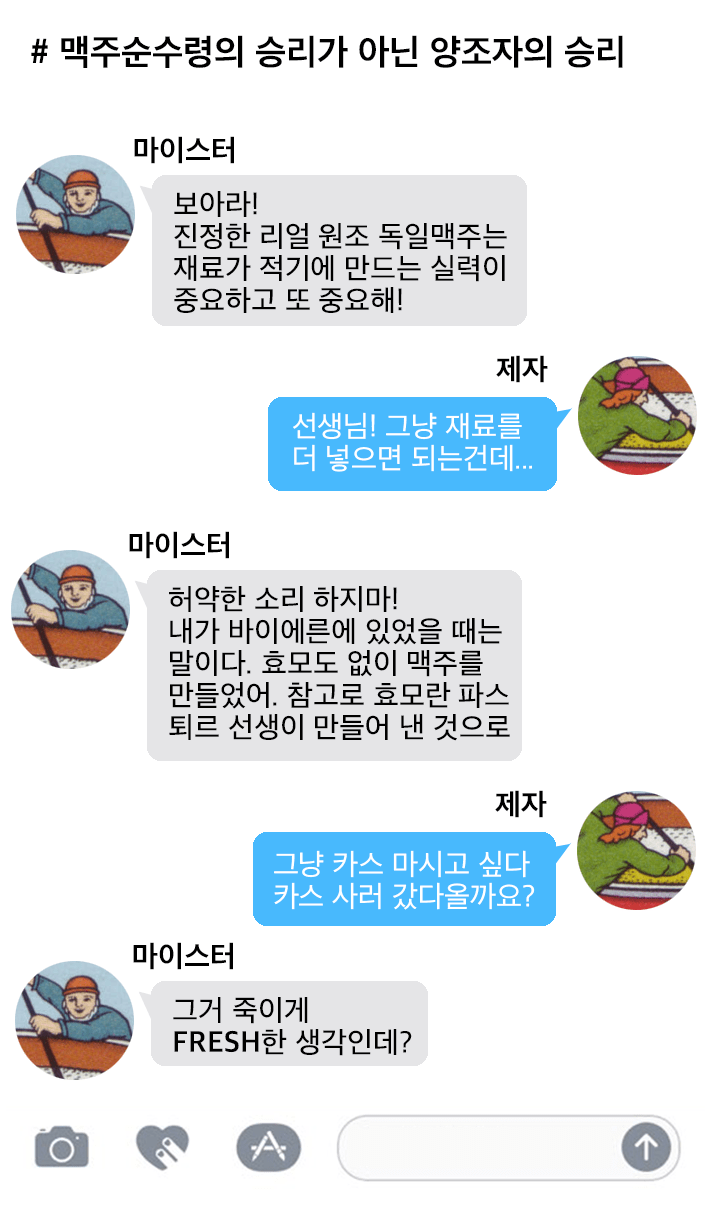
맥주순수령이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보리차 비슷한 맥주만을 마셨을 것이 분명하다. 첨가물 없이 건강한 맥주를 만들 수는 있어도, 맛있는 맥주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의 맥주 양조자들은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훌륭한 맥주를 만들어냈다. 이런 기술력을 ‘마이스터’ 제도를 통해 이어갔는데. 사실상 독일 맥주의 힘은 맥주순수령이라는 페널티를 가지고도 훌륭한 맥주를 빚은 독일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맥주순수령, 박물관과 백화점 사이에서
여전히 많은 독일 맥주 브루어리는 맥주순수령을 준수한다. 때문에 맥주 브랜드의 수는 많아도,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는 찾기가 어렵다. 아니 다른 스타일의 맥주들은 맥주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편이 가깝다.
반면 가까이 벨기에는 맥주순수령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덕분에 맥주에 별의별 것들을 넣을 수 있었는데, 약초나 과일, 초콜릿과 커피 등 여러 재료를 실험하다 보니 개성이 강하고 독특한 맥주들이 생겼다. ‘맥주계의 백화점’이라는 별명은 그들의 창의성에서 나왔다.
순수의 시대는 500년 만에 깨지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서 마시는 수입 맥주 중에 독일 맥주는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박물관이 될 것인가, 백화점이 될 것인가. 막연히 순수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에서는 녹록지 않은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