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다림 끝에 면접장의 문이 열리고 나는 결전의 장소에 들어섰다. 4명의 면접관 그리고 4명의 인턴쉽 지원자. 가장 먼저 입장한 나는 가로로 길게 배치되어 있는 자리의 가장 안쪽에 들어서서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출처: ambition box
하지만 아뿔싸, 가장 어려 보이는 면접관분이 나더러 다시 일어나서 ‘차렷-경례’로 다 같이 인사한 후에 앉으라는게 아닌가. 군대도 아니고 회사에서까지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다. 이어지는 자기소개의 시간. 담담한 나의 자기소개에는 무덤덤하던 면접관들의 표정에 이내 흡족스런 미소가 번졌다.
“저는 복숭아 같은 여자입니다. 겉은 무를지 몰라도 속은 단단합니다…”
내 옆자리 어떤 지원자분의 자기소개. 한 옥타브 높고 명랑한 목소리를 내는 그분의 아나운서 같은 미소와 그걸 바라보는 면접관의 표정이 내 눈 앞에서 서로 교차할 때,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회사가 찾는다던 ‘젊은 열정과 패기’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고. 면접관들의 눈에 나라는 사람은 아마 열정도 패기도 없는 지원자였을 것이었다. 나는 면접 시작과 동시에 나의 탈락을 예감했다. 인생 처음이었던 나의 국내 대기업 면접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났다.
그리고 그 면접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두 번 다시 국내 대기업에 원서를 쓰지 않았고, 심지어 구글 입사가 확정될 때까지 대기업 지원의 필수품인 토익점수도 만들어두지 않았다. 그만큼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이 면접이 너무도 강렬하게 실망스러웠다. 2011년 12월, 날씨만큼이나 마음도 허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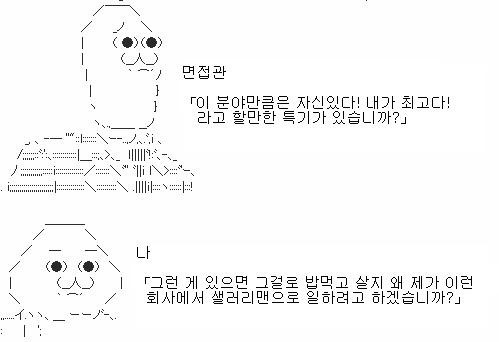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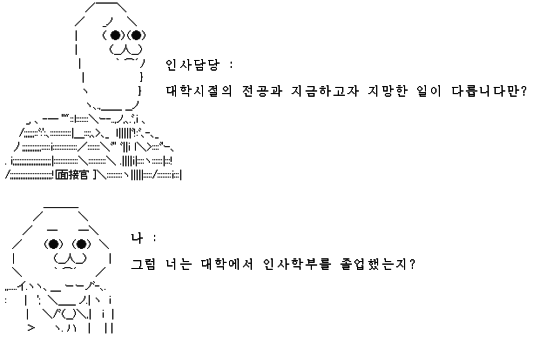
내가 이렇게 다소 극단적인 결론으로 치닫은 데는 그간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이 면접이 있기 전에 나는 사실 이미 몇몇 외국계 기업의 인턴쉽에 합격을 해 둔 상황이었고, 그중에서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경험을 쌓아보기로 마음을 정해둔 상태였다. 그 이전의 인턴쉽도 전부 외국계에서 했었던 터라 그래도 한 번쯤은 대기업을 간접경험이라도 하고 싶어서 지원한 것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 확연하게 많이 다른 것이었다. 특히, 면접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각 회사가 지원자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진정성을 담아내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서 모 IT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똑같은 4:4 면접이었음에도 같은 질문을 모두에게 기계적으로 묻지 않았다. 그분들 앞에는 엄청난 두께의 지원자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프린트되어 있었는데, 곳곳에 칠해진 노란색 형광펜 표시와 미리 개개인의 스토리에 맞춰 준비한 질문들의 깊이에 질문을 받는 내가 감탄할 정도였다.
또 다른 외국계 컨설팅 기업의 경우에는 인턴 면접이었음에도 파트너라고 불리는 임원분들과 1:1로 한 시간 가까이를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첫째로 본인의 지위에도 너무나 겸손하였고 둘째로는 내가 인턴이 되었을 때 배울 수 있거나 배워야 할 부분들 혹은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코치해 주기도 했다. 말할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업에 대한 깊은 견해와 지식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멋져서 내가 언젠가 꼭 닮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반면에 그 대기업과의 면접에서 면접관들 중 최연장자로 보이는 듯한 분이 보여준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귀찮은듯한 톤으로 툭툭 던지는 질문들. 그나마 질문도 앞서 다른 면접관이 했던 질문을 또 똑같이 해서 옆에 앉은 다른 면접관이 질문을 정정해주는 촌극도 벌어졌다. 그걸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설령 내가 뽑혀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인턴 생활’이 가지는 의미란
인턴쉽은 내가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디딜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가늠자이다. 단순히 스펙을 쌓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업종, 어느 업무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과 무슨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이 맞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은 면접을 진행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다. 면접을 하기 전후에 일어나는 인사팀과의 커뮤니케이션, 면접장에서 느껴지는 회사의 분위기, 면접관들이 면접과 지원자를 대하는 자세, 그들이 던지는 질문의 깊이, 그리고 내가 면접관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과 그 수준. 이 모든 부분들을 마치 내가 면접관이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살피다 보면 회사마다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
반면에 너무 긴장해서, 혹은 뽑히기만 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나중에 우리의 진짜 첫 직장을 고를 때 쉽게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 취업시즌이 되면 수 십 개의 가능한 모든 회사에 원서를 작성하고, ‘뽑아 주는 곳’에 간다는 얘기들을 심심찮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동시에 또 어느 한편에서 퇴사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건 얼마나 나에게 맞는 직장을 찾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처럼 인턴쉽을 준비할 때부터 꼼꼼히 살펴서 좋은 커리어의 시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
원문: Jeremy Cho의 브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