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일어나 신문에 발표할 칼럼을 써놓고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최영미 시인’이 검색어 상위에 올라있었다. 또 무슨 일, 하면서 읽어보니 홍보를 대가로 서울의 한 호텔에 1년간 투숙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는 가십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페이스북에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된 사실을 공개하며 밀린 인세를 내놓으라고 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모습이 좋지 않다.
최영미 시인의 첫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원래 제목은 ‘마지막 섹스의 추억’이었다. 디자이너가 표지작업까지 다 마친 것을 보고 나는 이시영 시인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시영 시인은 『시 읽기의 즐거움』에서 그 사실을 밝혀놓았다. “아니, 누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지막 섹스…’ 운운의 제목이 붙은 책을 들고 다니겠느냐?”고 말이다. 이시영 시인은 내 항의가 일리가 있는 주장이어서 “저자를 설득하고 설득하여 기어이 받아낸 제목이 뒷날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서른, 잔치는 끝났다’였다”고 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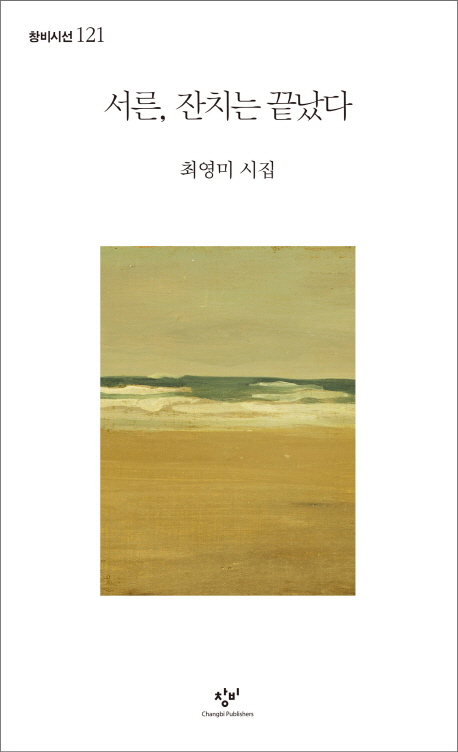
『서른, 잔치는 끝났다』은 ‘창비시선’ 121번이었다. 그때 나는 다른 이유도 댔었다. ‘창비시선’은 대학교수가 리포트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스승이 제자에게 ‘섹스’를 읽고 글을 써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였다.
하지만 이 책을 내놓고 여자가 나이가 서른이 되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그 나이가 마흔이 되었지만, 하여튼 여자들은 서른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다. 이제는 비혼주의자도 늘어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인간은 서른이든 환갑이든 100세든 나이 드는 것을 힘들어한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비난도 많이 받았다. 턱을 괴고 있는 사진을 광고의 모델처럼 활용한 것이 문제였다. 이후 저자 사진을 모델로 활용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원조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하지만 비판이 거세질수록 책은 많이 팔렸다. 그때 시인은 인세로 바퀴벌레가 출현하던 지하방에서 지상의 자신의 집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집 타령을 하니 안타깝다.
안타까워서 읽다가 바쁜 일 때문에 잠시 내려놓았던 『시를 읽는 오후』(해냄)를 다시 꺼내 읽었다.
“사랑과 죽음은 영원한 시의 주제이다. 이 세상에서 절실하게 말할 가치가 있는 건 사랑과 죽음뿐이다. 돈? 권력? 이 세상의 어떤 돈과 권력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지극한 정성은 가끔 기적을 만들어 ‘죽을’ 사람도 살린다.
죽음은 사랑보다 어렵다. 죽음이란 (개념은) 구체적으로든 은유적으로든 표현하기 어렵다. 사는 동안 우리는 사랑을 여러 차례 경험하지만 죽음은 한 번뿐이고, 이미 죽은 뒤에는 죽음을 말할 수 없기에, 사랑하는 남녀는 눈에 잘 띄지만 생을 마감하는 환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지난 몇 년 동안 종합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고 요양병원에 누운 살아 있는 시체들을 수두룩 목격했지만, 죽음에 대한 시를 나는 한 편밖에 쓰지 못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종합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든 이유가 자신이 아팠던 것인지, 아니면 지인이 아파서 그런 것인지 글로만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시인은 존 던의 「죽음이여 뽐내지 마라」를 소개하면서 “죽음에게 사형을 선고한” 마지막 행 “더 이상 죽음은 없으리; 죽음, 그대가 죽으리라.”가 압권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초월을 감히 시도한 시인.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운명을 시로 이겼으니 대단하지 않은가. 언젠가 존 던의 유해가 묻힌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에 가서 나도 죽음을 유쾌하게 음미하고 싶다.”
그는 또 평생 이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소개하고는 이렇게 적었다.
“내가 아는 시인들은, 위대한 예술가들은 대개 같은 장소에 오래 살지 않는다. 물론 나처럼 이사를 자주 하는 시인은 드물겠지만 보통 사람들도 평생 적어도 너댓 번은 사는 장소를 바꾸지 않나.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옮겨 다닐 수밖에 없지 않나.
대부분의 작가들은 호기심이 많아 여행도 좋아하는데, 디킨슨은 정말 별종이다. 가구처럼 자기 집에 붙박여 산 진짜 이유는 뭘까? 궁금해진다. 그녀는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자신의 방을 떠나기 싫어서……. 하긴 나도 이제는 집을 떠나기 싫다. 하나뿐인 내 방이 제일로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가 집이 다시 말썽이 나서 이런 사단이 났다. 안타깝다. 내가 영업하는 동안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의 저자들 중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이는 최영미 시인이 유일하다.
물론 술자리에서는 많이 만났고 ‘저자 강연’은 수십 차례 주선했다. 그런 시인이 이렇게 가십에 등장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런 일이 시인의 시가 아닌, 시인의 얼굴로 책을 팔아보려고 했던 첫 시집의 광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어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제발 최영미 시인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될 지상의 방을 빨리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원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