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위기설’이 시끄럽긴 시끄러운가 보다. 와이프가 아침에 묻더라. “물이랑 라면 사놔야 해?” 이렇게 대답해줬다. “그런 일이 있지도 않거니와(만일 그렇다면 내가 이미 어디 가라고 했지), 있어도 전쟁 나면 그거 먹을 새도 없어 이젠.”
8월 한반도 위기설의 중심에는 아마 점점 거세어지는 워싱턴의 수사(修辭)와 북핵 해법을 둘러싼 미·중간의 이견과 갈등, 그리고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거다. 세 가지만 따져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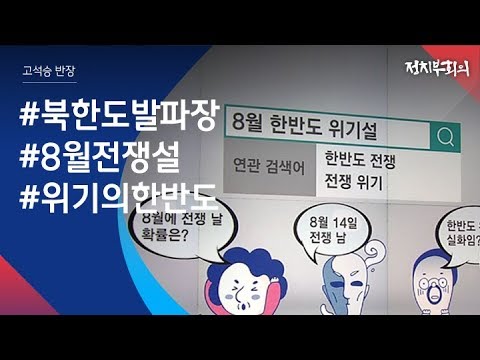
첫째, ‘한반도 위기설’의 중심에는 외교적 경고라는 수사의 전쟁, 과거와는 달리 1차 인용의 발언이나 분노의 표현도 여과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현대의 발 빠른 정보소통, 그리고 북한이라는 전례가 별로 없는(아예 없지는 않다) 막장 행보가 같이 엮여 있다. 문제가 되는 린제이 그레이엄(Lindsey Graham)의 발언을 인터뷰 근원처인 NBC의 보도를 중심으로 다시 보자.
“If there’s going to be a war to stop [Kim Jong Un], it will be over there. If thousands die, they’re going to die over there. They’re not going to die here. And He has told me that to my face.”
“김정은을 저지하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면 북한에서 끝날 거다. 수천 명이 살해된다면 그건 거기 일이다. 미 본토에서 수천명이 살해될 일은 없을 거다, 그는 내 면전에서 그렇게 말했다.”
국내의 일부에서 분기탱천한 바와 같이 ‘동맹국인 한국인이 죽건 말건, 주한미군이 희생되건 말건’의 뉘앙스가 아니다. ‘만약 전쟁 나면 북한 걔네는 골로 가, 우리가 아니고’의 표현에 가깝다. 물론 전쟁 나면 한반도에서 우리나 주한미군의 희생 역시 있겠지만 그 경우 ‘수천’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다분히, 제한적인 국지타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게 한 다리를 건너는 동안 상상의 나래를 펴고 소설이 난무한다. 그 자체도 엄청난 표현 아니냐고? 글쎄, 이걸 별다른 고려 없이 전달한 그레이엄 자체가 참 경박스러운 인간이지만 이것 역시 일종의 대북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이게 김정은에게 통할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만큼 미국이 빡쳤다는 걸 전달하는 메시지는 된다.
한반도에만 특유한 수사는 아니다. 2001년 9.11 당시 조지 부시는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파키스탄이 석기시대(stone age)로 돌아가도록 폭격해줄 수 있다’고 무샤라프에게 전달한 적도 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둘째, 우리가 우려하는 또 하나의 비일관성, 대화한다고 했다가 또 때린다고 했다가 미국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그럴까? 틸러슨이 한 말에 대한 ‘로이터’의 기사를 보자.
“The United States does not seek to toppl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would like dialogue with Pyongyang at some point, but only on the understanding that it can never be a nuclear power.”
“미국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떤 시기’에 대화를 원한다.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만 그렇다.”
즉 북한의 선제적 조치가 없으면 그 ‘어떤 시기’는 결코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은 북한 정권 붕괴를 원하거나 촉진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의 재반복일 뿐 아니라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 Engagement)’에서 한 발짝도 벗어난 기조가 아니다.
오히려 미 국무부와 국가안보실이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로 북한을 얼렀다 위협했다 하는 이 다양성이 우리에게서도 발휘되어야 한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은 아직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다. 워싱턴의 많은 싱크탱크 고수(高手)가 작년 연말 힐러리를 지지했다. 인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고 이런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대한반도 정책을 별로 이쁘게 보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이 중 일부의 인터뷰를 따다가 우리 언론이 물어 나른다. 쟤들 무슨 일 칠지 모른다고. 그들이 밖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조언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된다. 존 볼튼(John Bolton)? 여러 이야기에도 입각도 못 한 그의 주장이 실제로 트럼프의 심상을 반영할까? 그리고 볼튼이 현직에 있을 때조차 그의 강경책이 그대로 먹혔다면 이미 한반도에서는 몇 번 이상의 전쟁이 났다.

마지막, ‘코리아 패싱’을 한번 보자. 이건 사실 박근혜 정부의 삽질 그리고 모 前장관의 ‘러브콜’ 발언의 삽질이 사단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핵심은
- 주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을 배제한 협상,
- 이 협상 결과와 한국 국가 이익의 훼손이었다.
즉 ‘코리아 패싱’의 문제점은 결국 한국을 배제한 협상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이다. 만약 ①만 성립하고 ②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기 지나치게 몸을 달 필요가 없다. 한국이 모든 양자 협상에 주역이 될 수 있는 자원도 능력도 제한된 현실에서.
만일 박근혜 정부처럼 ‘북한이 위기에 빠지면 자동빵으로 흡수통일’을 내심 추구했다면 미·중 밀약에 의한 북한 김정은의 교체와 비핵화, 그리고 후속 친중정권 수립은 ‘코리아 패싱’의 전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점진적/평화적 합의 통일을 추구한다면? 미·중의 김정은 제거가 반드시 이익의 배치는 아니다. 그리고 이미 흡수통일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베를린 구상’에서 표명했다. 더 넓혀서 보자. ‘코리아 패싱’의 위험은
- 한국이 배제된 일방적인 미국의 군사행동과 한반도 군사충돌,
- 중국이 한국을 미워해서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와 북한 정권의 미래를 미국과 ‘쇼부’ 치는 경우,
- 위에서 이야기한 김정일 정권 붕괴 및 단기적인 분단 안정화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①은 현재 미·중간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부분이니 ‘패싱’이 일어날 수 없다. ②의 경우 결국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에서도 표방한 원칙과 배치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에서 주장하듯 이게 미·중 전략적 경쟁에 한국을 연루시키겠다는 워싱턴의 사악한 수라면 ‘패싱’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③은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다.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한반도 위기설’이나 ‘코리아 패싱’ 모두 학자 및 관측가의 자기 의제 및 진보/보수의 특정 이념 선호도에 따라 착취(exploitation)당할 가능성이다. 보수는 ‘문재인 정부가 중심 못 잡고 혼란에 빠져 있다’는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진보는 ‘미국놈들 믿다가는 무슨 일 날지 몰라, 그러니 북한에 더 양보해서라도, 중국의 편을 더 들어서라도’의 논리로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지 말자. 아직 출범 후 3개월이 채 안 된 ‘우리’ 정부다. 그 실패와 성공의 직접 영향 역시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 경계해야 할 만의 하나의 가능성 중 하나로 두지 않고 자꾸 증폭시키고 확산하다 보면 정부의 수(手)가 오히려 제약된다. 정부에 참가한 특정인에 대한 우려라면 그걸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런 독주가 발휘되기 힘든 시점이고, 그런 옥석을 가리는 능력이 대통령에게 있을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