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버리고 경제 환경이 변하는 흐름을 찾아내 이 변화가 여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
IT 분야에서 남다른 통찰력을 보여주는 박상민 님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 좋은 글’은 자신이 원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스타트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요지의 글이다.
응? 그럼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다 뭐람? 다 자신이 원했던 문제에 집중했던 거 아니었나?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인데 어쩌다 사회의 바람과 일치한 건가? 역시 인생은 운칠기삼. 아무래도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못한 범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조언이 아닐까 싶다. 자신과 사회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간극을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가치 있고 해결할만하다면 이미 그 문제는 다른 회사에 의해 해결되었을 것이다. 반대 논리로 당신이 관심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구조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도 해결하고 싶어 하며(이미 해결했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별로 절실하지 않거나(문제가 아니거나) 시장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인데… 음, 어쩌라는 거지?
First Mover
“환경의 변화를 제일 먼저 감지하고 시장에 어느 정도 동작하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회사가 길게 봤을 때 새로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많다.”
운 좋게 효율적인 시장이 해결을 원하는 문제를 발견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해결하라는, 결국 선도자가 되라는 얘기다. 스타트업하면 연상하는 테크놀로지 시장에서는 기술을 먼저 만드는 게 장땡이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쉽나? 넓은 시장, 널린 인재 덕에 짱짱한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이나 쉽지.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박상민 님의 이전 글 중 ‘장관님, 코딩은 좀 하십니까?‘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미국의 최신 인기 기술을 소개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팝송을 번역해 부르는 것처럼 미국의 인기 기술, 그 호사스런 미래상을 소개하는 사람들. 파워포인트에 미래상을 그려주면, 언젠가 진짜 엔지니어, 해커들이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
관치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글이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나라에서 뭉칫돈을 풀면 경기 부양에 눈곱만큼이라도 도움 되겠지. 지자체들이 경제성 없는 신공항, 철도 역사 등에 왜 그리 목메겠나. 반짝 효과라도 보자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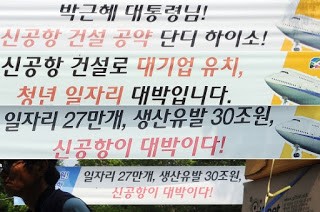
성공하는 스토리텔링
뭐 이런 우울한 얘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고(…) 기술을 만들었든 수입했든, 성공을 위한 그 다음 수순은 사람들에게 먹힐만한 스토리텔링 구사라고 한다. 이어서 소개되는 픽사에서 사용한다는 스토리텔링 법칙.
“옛날옛날에 ___이 있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은, ___ 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___. 그것때문에 사람들은 ___. 그리고 그것때문에 사람들은 ___. 드디어 사람들은 ___.”
다음은 픽사 스토리텔링 공식에 때려 맞춘 빅데이터 스토리. 미국 기술은 스토리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좋다.
“옛날 사람들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종사하는 보안관제 분야의 스토리도 만들어보자. 이 분야의 문제는 분석해야 할 로그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이는 분명 해결할만한 가치를 지닌 문제다. “수십만, 수백만 라인의 1GB 이상의 로그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려면”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를 원할 것이다.
“사람들은 해킹이 무서워 컴퓨터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로그가 너무 많아서 다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짱 좋은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은 모든 로그를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짱 좋은 기술’로 IDS 등의 단일 보안 장비부터 ESM 등의 통합 보안 장비와 빅데이터까지, 수많은 미국발 최신 기술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제시되어 왔다.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안타깝게도 해결되지 않았다. 근거를 들자면,
- ‘짱 좋은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 등장. 지난 몇 년 간 ‘짱 좋은 기술’로 각광받아왔던 빅데이터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
- ‘짱 좋은 기술’의 효과 측정 사례 전무. (기존 대비 개선 수치만큼 좋은 마케팅 소재가 없음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짱 좋은 기술’들이 줄기차게 제시되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구조적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 아닐까? 답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 ‘로그가 너무 많다’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거나
- 시장이 비효율적이거나
정답은?
내 짧은 생각으로는 둘 다인 것 같다. 일단 보안이 중요하다는 가정하에 분석해야 할 로그가 너무 많은 것은 분명 문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많은 로그를 일일이 분석하려는 시도 역시 문제라고, 삽으로 산을 옮기려는 무식한(비효율적인) 짓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자동화 마케팅의 역사가 깊기도 하고,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건 인지상정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결국 이런 스토리를 원하는 듯.
“드디어 인공지능이 모든 로그를 자동으로 분석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끝판왕이 되어주기만을 바란다(더 나올 기술이 있을까? 인공지능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남은 건 외부 이슈 몰이뿐인데).
두 번째, 시장이 항상 효율적일 수 있을까? 160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부터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까지 일련의 시장 붕괴 사태는 무엇을 의미할까? 인간은 종종 ‘따먹지 못하는 포도 = 맛없는 포도’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지곤 한다. 비합리적이기 쉬운 인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긴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장은 언제 효율적으로 동작할까? 앞서 언급한 금융 위기들은 모두 거품이 계속될 거라는 환상에 기대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시장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였다. 즉 정보가 적시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장일수록 효율적으로 동작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고유가 시대의 인기 자동차 조건은 연비일 테고, 자동차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연비 개선에 집중할 것이며, 당연히 연비 높은 차가 잘 팔릴 것이다. 하지만 애당초 아무도 연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비효율적인 시장에서는 문제의 해결 가능 여부를 떠나 문제 인식 자체가 쉽지 않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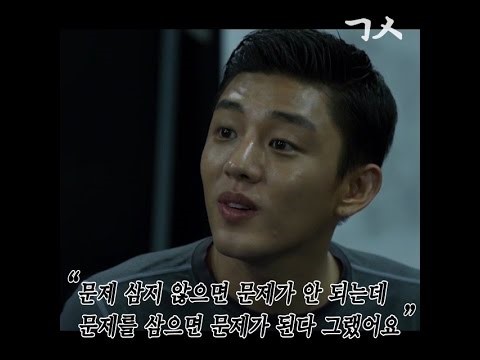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인 시장도 있다.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영영 발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전쟁에 한 번 써먹자고 세금을 퍼부어야 하는 군대가 대표적.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 역시 쉽게 드러나는 ‘2,000억짜리 홈택스‘와는 달리 군함에 어선 음파탐지기를 달아도, 헬기에서 비가 새도 티가 잘 안 날 만큼 폐쇄적이며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절대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쏟아부은 만큼 우리는 안심이 된다.
결론은 성공하는 스타트업, 롱런하는 스타트업이 되려면 먼저 투명성이 높은, 그래서 효율적인 시장에 집중하는 게 낫다. 일단 문제 찾기가 쉽고, 나와 시장이 해결을 원하는 문제가 일치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마지막으로
해운 혁신을 일으킨 컨테이너 아이디어 덕에 ‘20세기를 바꾼 인물(2007년 포브스)’에까지 선정된 말콤 맥린은 아이디어를 실행하기까지 19년씩이나 걸렸음에도 ‘베트남전’ 특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더라.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면 시장의 문제를 선점해도 방심은 금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