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는 경남과학고를 수석으로 입학했다. 서울과학고 수석에 간발의 차이로 뒤져서 전국에서는 2등이었다고 한다. 과학고에서는 매달 KAIST 입시 본고사와 같은 포맷으로 월례 고사를 봤는데 졸업할 때까지 1등만 했다. 2학년 마치면 내신 성적순으로 60명 중 20명 정도는 KAIST에 무시험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 원서를 쓸 때는 TO가 몇 장이 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조마조마해 했다. 나는 담임 선생님께 무시험 전형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어려운 양보를 했다며 감탄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내가 별 희한한 잘난 척을 다 한다고 아니꼽게 보는 동기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학 입시라는 비중이 있으니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진 못했다. 내가 친구를 끔찍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는 정도로 부담감이 없었다. 900점 만점에 평균이 500점쯤 나올 때 내 점수는 750점이 넘는 식이었기 때문에, 150점짜리 한 과목쯤 통째로 안 봐도 넉넉하게 합격할 자신이 있었다.
입시 당일 아침에 동문 선배들이 출정식을 벌여주고, 고사장 직전까지 따라온 수많은 학부모가 일제히 기도하는 것을 보니 그제야 조금 긴장되기도 했다. 오전 시험을 마치고 나니 절대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시험에는 긴장이 풀렸는지 깜빡 졸았다가 감독관이 깨워 주기도 했다. 그리고도 결국 20등 안에 들어 당시로써는 거금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나중에는 돈에 눈이 멀어서 무시험 원서를 안 썼다는 얘기도 돌았던 것 같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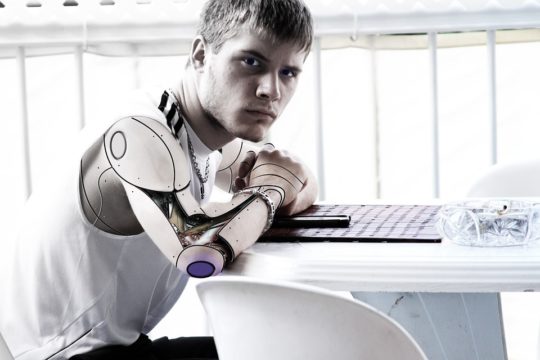
2.
입시에 있어서는 재수 없을 정도로 천재였지만, 나는 한편으로는 내가 뛰어난 과학기술자가 되기에는 결정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다. 상상력, 창의력은 고사하고 호기심이 부족했다. 기계/전자 제품을 뜯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당시 유행하던 과학상자, 만능키트 같은 것도 그저 매뉴얼만 따라 했지 한 번도 책에 없는 것을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았다. 입시 성적은 나보다 한참 떨어졌지만 이런 호기심이 있던 친구들이 더 뛰어난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획일화된 입시로 스무 살도 안 된 어린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 특히나 좋은 엔지니어나 과학자가 될 자질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3.
아주대에 부임해보니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바람에 더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아주대에 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였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줬다. 네가 재수해서 서울대나 연/고대쯤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갖고 후회하지 말고 네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라이선스 하나로 먹고사는 분야에서나 평생 학교 간판 따지지, 엔지니어는 회사 들어가서 6개월만 지나면 어느 학교 출신인지 볼 필요가 없다. 그 정도 일 시켜보면 실력이 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4.
너는 한국에서 나름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으니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IBM 연구소에 막 취업했을 때 학벌 때문에 제법 주눅이 들어있었다. 매니저는 예일, 시니어 매니저는 하버드, 디렉터는 버클리를 나왔고, 팀 동료 네 명은 각각 스탠포드, ETH Zurich, 칼텍, MIT를 나왔는데, KAIST는 국내에서나 잘난 척하지 미국인들 중에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5.
그런데 department 차원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되면 그 쟁쟁한 학교 출신들이 모두 옆 팀에 있던 Troy라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반도체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려면 IC 회로, 패키징, 통신 아키텍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Troy가 바로 이 세 분야를 통섭한 실력자였다.
대학원에서 회로설계를 공부한 다음에 모토로라에 들어가서 통신 시스템을 연구했고, IBM에 와서는 패키징까지 공부해서 전체 시스템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in-house 툴을 혼자 만들었다. IBM으로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인물이었으니 Troy의 연봉은 디렉터는 물론이고 VP보다 높았을 것이다. 내가 IBM을 퇴사할 때 제일 아쉬웠던 점도 바로 Troy한테 더 이상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6.
언젠가 Troy와 공저한 논문이 출판 결정되어 biography를 요청했다. 사실 그 전까지 Troy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은연중에 탑 스쿨 출신이겠지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Troy가 적어준 biography를 논문에 써 넣다가 깜짝 놀랬다.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라는 생소한 학교였다.
7.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상담하러 오면 우선은 바로 취업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부를 꼭 대학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실제 문제와 부딪쳐보고 나서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진학해도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취업 시장이 해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8.
그래도 굳이 당장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면, 그다음으로는 그 점수로 어떤 학교들에 갈 수 있는지 옵션을 쭉 읊어준다. 연고대도 대학원은 미달이니까 어느 정도 성적 관리를 했으면 대개 서울 시내 아무 대학이나 골라갈 수 있다. 그러니 꼭 자대 진학만을 생각할 필요 없다고. 대신 타대에 진학하고 싶으면 정보가 부족하니 부지런히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
수업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이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지만 (물론 가끔 학부생한테는 천사였다가도 대학원생한테는 괴수로 돌변하는 사람도 있긴 하다), 타대에 진학할 때는 그런 피상적인 정보조차 없으므로 자대생이라면 누구나 기피하는 연구실로 배정될 위험 부담이 있다.
9.
잠재력이 보이는 학생은 내가 붙들어서 잘 키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열심히 가르치면 탑스쿨 대학원생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타대 진학했다가 괴수한테 걸리면 어쩌지…’ ‘내가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나…’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 학생이 내 아이라고 생각해본다. 그러면 대개 더 좋은 연구 환경을 갖춘 학교에 있는, 열심히 연구하려는 교수를 소개해주는 것으로 결론 난다.
그 교수 밑에서 똑같이 노력해서 같은 성과를 내면 그편이 학생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나는 ‘학벌주의’에 반대하지만, 현실에서는 차별이 존재하며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정한다. 또, ‘학벌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생한테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할 생각도 없다.
10.
그런 다음에는 그 교수한테 잘 보일 방법을 코치해준다. 그 랩에서 최근 발표한 논문들을 공부한 다음에 그중에 흥미 있는 문제를 정해서, 학부생 수준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contact 한다면 십 중 팔구 호의적인 반응이 올 수밖에 없다.
11.
이렇게까지 해주겠다는데 굳이 내 연구실에 오겠다는 학생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는다. 다른 데 갔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원문: 감동근님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