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캐스트를 계속 살펴보면서 ‘하우 투(How to)’ 포맷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면 당시의 미디어 환경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하우 투 포맷에 대한 생각은 다음 글에 적어볼까 한다).
2011년쯤에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들이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다. 페이스북은 여전히 기업들의 관심 대상이었고 미디어로써 잠재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팔로워가 10~20만이 넘는 국내 페이지는 소수였고 도달율도 높았다.
동영상은 많이 없었다. 심지어 나도 페북을 하나의 채널링으로 인식, 서브로 보는 개념이 많았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페북이 끼치는 영향력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유튜브는 잠재력을 키워오는 시기였고, 국내 포털은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서비스 특성을 가지고 있어 논외로 했다.
쉐어하우스 초반의 콘텐츠와 채널 전략의 토대는 Web 2.0과 롱테일이다. ‘누구나 한 번 쯤은 찾을 만한 콘텐츠’로 웹을 기반한 롱테일을 이루고 ‘누구나 공유하고픈 콘텐츠’로 쉐어하우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쉐어하우스닷컴은 좀처럼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아 서브로 운영했던 페이스북 채널도 롱테일 전략과는 맞지 않게 되었다. 이쯤이 2013년 말이다. 허접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다.
유튜브를 개설하고 페이스북에도 콘텐츠를 유통하고 쉐어하우스닷컴을 중점으로 키워 보고자 했다. 역시 만족스럽지 않고 이때부터 쉐어하우스의 콘텐츠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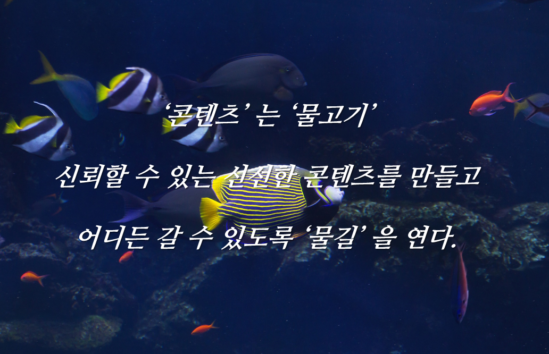
쉐어하우스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콘텐츠로 만드는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전략으로는 도무지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었다. 각 플랫폼의 비즈니스 방향과 콘텐츠 활용도를 생각하다 보니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알다시피 초기 스타트업, 아니 미디어 스타트업은 없는 게 너무 많다. 콘텐츠의 양도 적고, 미디어력도 없고, 돈도 없다.
그래서 쉐어하우스는 플랫폼들의 다양한 서비스들에 채널을 개설하고 유통을 하기 시작한다. 빙글, 네이버 포스트,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스토리 등등. 물론 채널을 만드는 건 시작일 뿐 플랫폼별로 운영전략이 상이하다. 우연한 계기로 쉐어하우스 콘텐츠를 다나와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콘텐츠 채널링 제휴 사례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면 콘텐츠와 미디어 플랫폼 간에 윈윈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 한다. 나아가서는 콘텐츠의 확산을 넘어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커버리지가 다양화되는 장점을 가진다.
커버리지가 좋아지는 것은 퍼블리시티의 차원에서 콘텐츠와 배포 관점에서 확산 가능성에 있어서 큰 장점이 된다. 콘텐츠가 확산될 잠재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랄까? 그들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고, 콘텐츠를 필요로 한다.

여전히 쉐어하우스닷컴이 기능적인 플랫폼 서비스 사이트로 발전하기엔 요원해 보인다. 여기에는 크게는 한국의 온라인 생태계 환경이 있고 막강한 플랫폼(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들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는 미디어 서비스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측면이다.
몇 가지 희망적인 것은 쉐어하우스가 독자를 모이게 하고 콘텐츠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상황에서 재능이 있거나, 알리고픈 콘텐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쉐어하우스의 ‘하우스메이트(HowsMate)’는 이렇게 시작했다. 쉐어하우스보다 콘텐츠를 더 잘 만드는 파트너들이 우리랑 함께 콘텐츠를 선보이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문: Teddy Bae의 브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