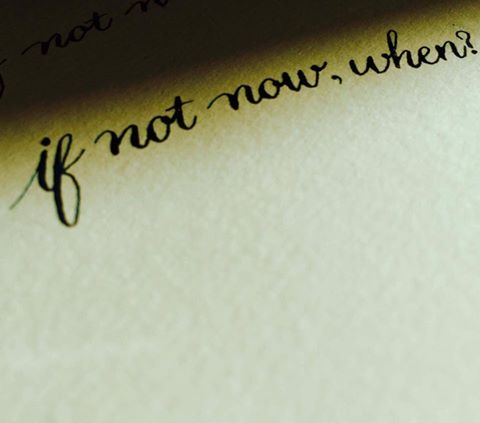한 페이스북 유저의 글을 본 적이 있다. 페이스북에서 “페미니즘을 외치는 사람의 피드를 가보았더니 무척 살기 좋아 보였다”고 말하며, 여행은 물론이고 남자친구에게 받은 선물 사진이나 식도락을 즐기는 사진 등이 많았다고. 그 사진들과 여자로서 살기 힘들다는 말이 매칭되지 않는다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괴리감을 피할 수 없다.”

괴리감이라. 그 괴리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
‘불쌍하고 얌전하고 부족하게’ 보여야 한다는 사람들
오래전 교육 봉사를 지원했던 적이 있다. 처음에는 아는 오빠가 하는 일을 돕는 차원으로 종종 나가다가 나중에는 애착이 생겨서 시간이 되는 한 열심히 나갔다. 그 모임의 직업군은 실로 다양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대학생이나 공부방을 운영하시면서 자녀를 두신 분,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 등등.
그중 사회복지사로 실제 일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는 실로 암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를 업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갈아 넣어야 하는 결정인지, 자살률은 어떻고 일에 밀린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들었던 이야기 대부분을 기억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자주 떠올리게 되는 일화가 하나 있다. 무척 짧은 대화였지만 특히 최근 들어 자주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아마 이 이야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나에게는 꽤 충격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날 센터로 항의 전화가 들어왔다고 한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렇게 말인즉슨, 자기 동네에 있는 아이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식권인지 얼마간의 현금인지를 받으며 지내는 모양인데, 그 아이가 주변 가게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 가게가 흔히 아는 유명 체인점이었단다. 일반 분식집보다는 비싼 편인, 일식에 가까운 질 좋은 돈까스를 파는.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가 밥을 먹는 게 불쾌하다며 전화가 왔더라는 것.
“아이들이 기초 수급을 받는 것은 좋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먹어야 할 일이냐. 기분 좋게 점심 먹으러 갔다가 기분을 잡쳤다. 제 누나와 둘이 와서 하나를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한 메뉴씩 시켜서 먹고 있더라. 식권이 얼마씩 나가기에 내 세금으로 낸 돈이 그냥 분식집에서 먹어도 똑같이 배부를 일을 굳이 좋은 곳에서 기분 내며 먹는 행위에 들어가야 하느냐.”

추후 알아보니 해당 음식점의 점주 분이, 식권으로는 가격이 모자라지만 아이들이 예뻐서 종종 전화를 하시거나 지나가면 불러 세워 “얘들아, 오늘 저녁 안 먹을래?”해서 공짜로 아이들의 밥을 먹이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그게 손님이 ‘기분 나빠’ 할 일인지는 몰랐다며 점주 분이 무척 놀라워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봉사자 모두가 경악했다. 참담한 일이었다. 나도 무척 놀랐고, 너무 놀란 나머지 부모님께도 말씀 드렸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이를 꽉 깨무시며 “너절한 인간들.”이라고 중얼거리셨는데, 이 일은 그 후로도 너무 많이 떠올려서 이제는 아이들의 밥을 먹는 광경이 꼭 내 기억마냥 선명하다.
그 외에도, 봉사에서 내가 맡아서 가르쳤던 아이의 생일에 틴트를 선물했더니(한창 꾸미고 싶어 할 나이인 데다 내 화장품에 늘 관심이 많았다), 무척 좋아하며 말했다.
“그동안 화장품이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넌 화장품 살 돈은 있나 보다?’라고 해서 너무 속상하고 눈치 보였어요.”
또, 이런 기억도 있다. 학교 운동회와 관련한 남학생의 이야기인데, 평소 자주 밥을 먹던 밥집의 아주머니가 운동회를 맞아 유부초밥과 반찬 등을 예쁘게 싸 주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친구의 학부모가 말하기를 “어머 얘, 보통 애들보다 더 잘 먹고 다니네?” 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짜증 섞인 웃음을 지으며 “00야, 그걸 가만히 있었어? 겁나 맛있게 쩝쩝 먹으면서 그러게요? 아줌마 밥보다 낫네요? 라고 대답해주지 그랬어. 친구 입에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말했지만, 기어코 속이 상해 수업이 끝나고 밖에 나와서 울어버리고 말았다.
이 외에도 이웃의 페이스북에서 접했던 뉴스 중, 복지 아동에게 ‘굳이 브랜드 피자를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담긴 뉴스를 보았을 때나 ‘브랜드 신발이 보육원 신발장에 있으니 후원을 끊겠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등등.
꽤나 자주,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는 사실이 나는 무척 슬프다.
보는 사람이 흐뭇할 ‘허락된 행복’만을 누려야 하는가
어떠한 기본적인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르짖는 것에서조차 ‘불쌍하고 얌전하고 부족하게’ 보여야 한다면, 그들은 영영 자신이 행복할 일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인가? 없이 살고 힘들게 사니까 조그만 것에도 기쁘지 않냐고? 소박해도 그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고?
그야말로 구린내가 풍기는 생각이다. 구시대적인 데다 완전히 강자의 위치에서만 생각하고 내뱉는 저열하고 기만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럼 그들은 언제까지고 돕는 사람이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허락된’ 행복만을 누려야 하는 것인가? 끝끝내 딱 그 정도의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나?

누군가 무엇을 얻기 위해 투쟁할 때, 기본적인 것조차도 누릴 수 없어서일 때가 분명 있다. 그러나 왜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부담을 지고 평가절하당해야 하는가?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 여성 인권? 인도에서 태어났어 봐!”
이 말인즉슨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더 불행했을 테니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아, 난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행복하구나.’ 해야 한다는 말인가? 너무 질 떨어지는 발상이 아닌가? 누군가의 불행을 발판 삼아 자신을 위로하는 행위가 얼마나 저열하고 한계가 뻔히 보이는 생각인지 도대체 모르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보다 불행한 줄 알았던 사람이 행복해 보일 때, 나는 반대로 시소에 탄 듯 아래로 내려가 나의 삶을 불행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인가?
그래서 경비원분들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가져다주고, 동성애? 내 주변인만 아니면 돼! 라고 대답하고, 임산부석이 뭐가 필요해요, 노약자석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복지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충분하잖아? 아예 없거나 못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잖아?”라고 말하는 것일까?
누군가가 존재하고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허락되어야’ 하는 세상에 멈춰 서서, “차차 나아지겠지. 너무 급격히 변하려 들면 반발을 사는 법이야. 나중에, 나중에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내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다.
“If not now, w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