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t Dragon, Cancer
한국에서 게임이 미디어에 소개되는 건 보통 두 가지 경우다. 범죄자의 컴퓨터에서 게임이 발견되었을 때, 게임이 외화를 잔뜩 벌어다주었을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이란 문화를 향유하지만, 향유층의 경계선을 넘어서면 여전히 게임은 문화가 아니라 무가치하고 반사회적인 그 무엇인가로 여겨진다.
이 기사가 그런 선입견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한국의 설 연휴 첫 날, 태평양 너머에서 뉴욕타임즈는 한 편의 게임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리그 오브 레전드나 폴아웃처럼 유명한 게임은 아니다. 제목은 이렇다. <댓 드래곤, 캔서(That Dragon, Cancer)>.
그 드래곤, 암.

<댓 드래곤, 캔서>에서, 죽음이란 (주: 평범한 게임들에서 쉽게 추가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5살 말기 암환자 조엘 그린과 그 부모 라이언, 에이미에 대한 게임입니다. 단 하나뿐인 삶에 대한 게임이죠. 언젠가 끝이 나고, 그러고선 영영 떠나버리는 것이요.
게임이란 매개를 통해 플레이어는 5살 말기 암환자 조엘 그린의 체험을 공유한다. 환상과 꿈, 현실의 흐릿한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말이다. 물 속을 유영하고, 전사가 되어 드래곤과 싸우기도 하지만, 또한 지극히 현실적인 병실과 조엘의 방 같은 공간에서 실제 조엘의 웃음과 울음을 듣기도 한다. 조엘 생전에 게임을 기획하며 미리 녹음한 것이다.
유익과 유해
<댓 드래곤, 캔서>같은 게임이 등장했을 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은 “이처럼 건전하고 유익한 게임도 있다”는 것일 것이다. 그만큼 게임은 무익한 것, 심지어 해악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 에스트로겐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디스4이아(Dys4ia)>를 만들었던 안나 안트로피의 말을 들어보자.
“저는 이 게임들을 일종의 교자재로 보는 게 걱정스러워요. 그냥 게임, 다만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으로서 이런 형식을 취한 게임으로 보는 대신 말이죠.”
“이 게임들에 어떤 목적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뭔가 멋진 생각들을 얻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환원주의적인 것처럼 보여요.”
단순한 최루성 연출을 넘어, 암이라는 드래곤과 싸우는 아이의 이야기를 다양한 은유를 동원해 게임이란 틀로 빚어낸 것을 보며, 나는 자연스레 한 단어를 생각하게 된다. 예술.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예술작품들과 이 게임 사이에는, 과연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일까. 게임은 예술로 간주될 수 있는가? 모든 게임이 그럴 수 없다면, <댓 드래곤, 캔서>와 같은 게임들은 예술로 볼 수 있을까?
이건 여기서 논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문제다. 하지만 굳이 거기에 답을 내리지 않더라도, <댓 드래곤, 캔서>를 두고 유익성을 논하는 것이 뭔가 부적절해보이는 건 사실이다. 한 생명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공개한 일련의 과정 그 자체가 가치있고 유의미하다. 굳이 여기에 유익성을 따지는 것은, 아마도 <댓 드래곤, 캔서>가 달고 있는 게임이라는 꼬리표 때문일 것이다.
게임의 범주
누구나 비디오 게임 하면 떠올리기 마련인 일종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겠지만, 게임의 양태는 그 폭이 무척 넓다. 대상과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받는다는 점 정도를 제외하면, 공통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뉴욕타임즈 기사가 소개한 또 하나의 게임 <더 매리지(The Marriage)>는 사각형, 원 등의 도형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말고는 상호작용이랄 게 없다. 이 게임에 결혼이라는 제목이 붙은 걸 보니, 왠지 영화 <나를 찾아줘>의 대사가 생각난다. “그게 결혼이지.”(That’s marriage).
한편 올해 최고의 게임으로 손꼽히는 <더 위쳐: 와일드 헌트>나 <폴아웃 4>는 수려한 그래픽과 높은 자유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체험하는 느낌을 준다. 완전히 다르지만, 모두 게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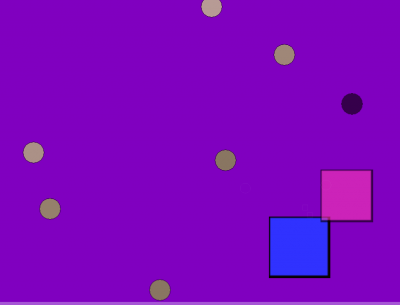

심지어 <스탠리 패러블>이란 게임은 일반적인 게임에서 기대할 수 없는 엉뚱한 피드백을 통해 게임의 ‘상호작용’이란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말하자면, 게임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려 드는 발칙한 게임인 것이다.
확장은 게임이란 범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란 범주를 넘어서도 일어난다. 게임과 게임이 아닌 것, 가상과 현실의 경계도 눈에 띄게 흐릿해지고 있다. <스탠리 패러블>은 게임 속에서 어디까지가 게임의 경계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이를 허물려든다. 오큘러스 리프트를 위시한 가상현실기기는 바로 눈앞에 다가왔으며, 얼마나 거대한 변화가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온라인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들은 연구자들의 이목을 잡아끌고 있으며, 아바타를 조작하는 게임의 룰이 현실 세계에서 재현되기도 한다.
결국 게임이란 그야말로, 틀 속에서, 혹은 틀조차 넘어서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들이다. 게임이라는 꼬리표 하나로 이 광범위한 영역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게임이란 이런 것 – 이라는 고정관념을 강요하고, 심지어 이런 고정관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규제를 도입하기도 한다. 주류 언론들은 비디오 게임의 유해성을 말하고, <댓 드래곤, 캔서>는 유익한 게임의 일례로 소개한다. 규정하기엔 너무 거대한 것을 규정하고, 범죄시하고, 변호하고 있는 셈이다. 게임이란 꼬리표를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최근 최고의 게임 스튜디오 중 하나로 손꼽히는 베데스다는 자사의 유명 포스트 아포칼립스 롤플레잉 게임 <폴아웃> 시리즈의 영화화 제의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는 게임을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형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게임 개발자이지 TV나 영화 제작자는 아닐 것이다.”
아름답게 디자인된 세계와 음악, 장대한 이야기와 감정을 고조시키는 연출을 바라보고 있자면, 그들의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원문: 예인의 새벽 내리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