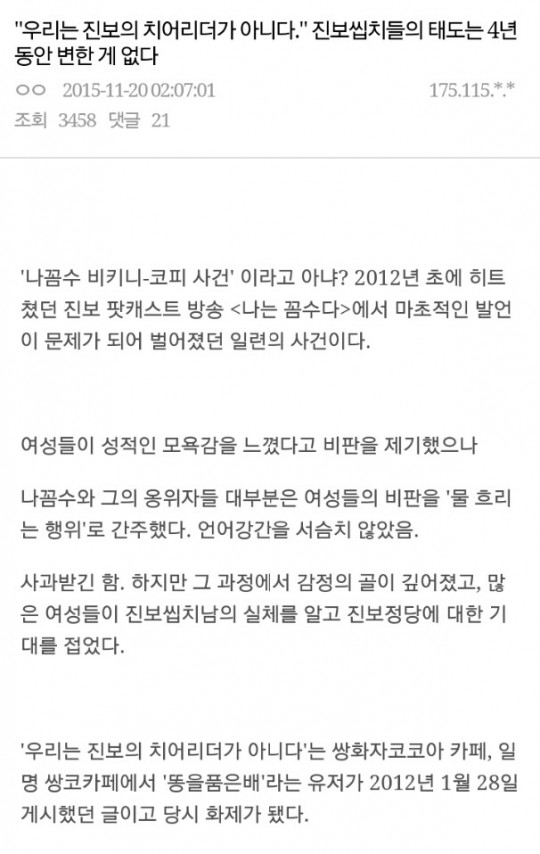
여성들이 주류정치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2012년 나꼼수 비키니 응원 논란과 같은 현실 정치의 사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사회 내에서도 일어난다.
성희롱이 일상화된 교수님이 있다. 술자리에서 여학우를 ‘예민충’으로 몰아갈 만큼의 딱 그 정도 성희롱만 한다. 제자들과 같이 간 노래방에서 여주인에게 추파를 던진다거나 음식점 여사장에게 술을 받으라 하는, 술자리에서 꼭 욕을 섞어가며 불편한 말을 하시는, 어느 과에나 있을 법한 그런 흔한 교수님, 지성인이라기 보다는 지식인이라는 표현이 어울릴법한, 그런 교수님이 있다.
이 교수님과의 술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행태는 아주 전형적이다. 경쟁적인 아부가 그것인데, 교수님 주변의 3~4명의 사람들만이 경쟁적으로 아부를 하고 자신의 존재를 어필할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그 몇 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불편한 웃음만 짓는다. 그리고 술자리가 마무리될 때 즈음에는 경쟁에서 이긴 제자들과 교수님의 훈훈한 도원결의가 이루어진다. 성별과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당신이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이런 종류의 술자리에 한 번쯤은 참석해 보았을 것이다.
그의 애매한 성희롱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불편한 미소만 지었던 내 자신이 싫어서였을까, 아니면 아부경쟁에서 이기지 못했던 내 열등감 때문이었을까? 이 교수님과 술을 마신 뒤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났고, 21세기의 스마트한 이 시대에 어떻게 정치를 가르치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며 다음 술자리에는 녹음해서 신고하고 싶다고 학우들 앞에서 길길이 날뛰었다. 친한 여자동기 한 명이 ‘잘 참았다’며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다. 모두들 “아~ 그 교수? 또라이지”, “원래 그 교수 좀 그래”라며 쓴 웃음을 짓는다. 20세기의 지성 버트런드 러셀은 “냉소는 힘 없는 자의 위안”이라는 말을 했다. 학생이 무슨 힘이 있나, 졸업하면 끝인데 그냥 다녀야지. 별 수 없다는 식이다.
그런데 이 교수님에 대해 남학우들과 말을 하면 그들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공감’을 하다가도, “그래도 우리 과 학생들 챙겨주고 어디 잘 꽂아주시는 분은 그 교수님 밖에 없지”라며 변화의 불씨를 훅 꺼버린다. 대화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 “우리 챙겨주시는 분은 교수님 밖에 없다”며. 그래, 우리 과 학생들 잘 챙겨주셨고 어디 잘 꽂아 주셨지. 근데 그 ‘꽂힘’당하는 애들이 전체에 몇 명이나 되나? 그리고 그 ‘꽂아주는’ 애들 중에 여자들은 있었나? 이것은 늘 그들만의 정치였고, 남자들의 규칙이었다. 여학우들은 항상 그 정치에서 배제되었고, 기껏해야 성희롱의 대상일 뿐이었다.

여성인 나를 이 정치판에 끼워달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 정치라면 난 사절이다. 다만 부조리함이 곧 현실정치일 순 없다는 얘길 하고 싶은 것이다. 러셀 말이 맞다. 냉소하는 것이 쉽고 편하다. 변화는 느리고 학생들은 권력이 없으므로. 그러나 대학사회에 매년 들어오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한다. 무언가 크게 바꾸진 못한다 해도, 군대처럼 ‘어쩔 수 없어’라고 참고 제대하듯 졸업을 기다릴 수는 없다. 적어도 ‘부끄러워’는 해야 한다.
원문: 김나연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