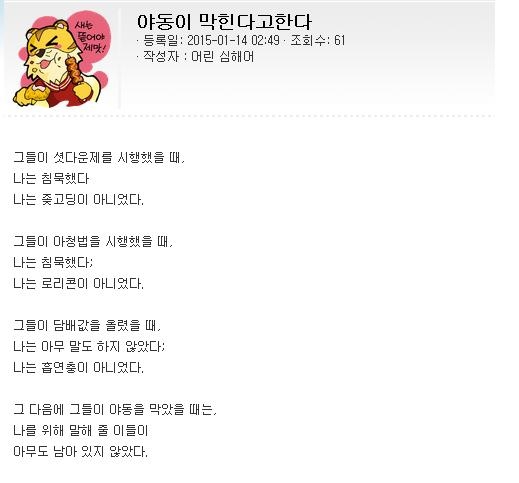동성애자가 수백 명의 파트너와 섹스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동진은 “나 동성애자인데… 꼭 동성애자가 되고 싶다”는 씁쓸한 농담을 한다. 기민은 “알고 보니 내가 동성애자가 아닌 것 같다, 다시 커밍아웃해야겠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루머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응은 웃기면서도 슬프다. 요새는 이런 걸 줄여서 ‘웃프다’고 하던가?
동성애자 등 수많은 성소수자들과 알고 지내지만, 나는 수백 명과 섹스를 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자기 공부 하거나 먹고살기 바쁜 사람은 여럿 알지만. 그러나 동성애자가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의 파트너와 섹스를 한다고 주장하고, 전립선이나 항문성교를 운운하며 “너희는 이런 섹스 하지?”라는 성폭력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뱉는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성소수자 혐오세력이다.

상대가 성소수자든 아니든, 남의 성생활에 대해 함부로 아무 말이나 쑥덕이는 게 심각한 결례라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성소수자에게 범한 결례는 결례로 치지 않는 걸까? 나로서는 도무지 모를 일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동성애가 질병이라는 케케묵은 주장을 하며, 당신들이 이 질병을 치료하여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급기야 ‘탈 동성애자 인권’이라는 말로 인권을 졸지에 동네북으로 만든다.
동성애를 치료하려는 시도에 대해, 양성애자 폴라는 이렇게 일갈했다.
동성애가 정신과 진단명에서 빠진 게 언제 얘긴데, 진단명도 없는 병을 치료하겠다니? 화타의 환생이라도 되시나 보다.
혐오로 찌푸려진 사회의 민낯
동성애에 대한 루머를 전해들을 때면, 나치 정권이 우월한 아리안이라 선전한 아기가 알고 보니 유대인이더라는 말이 떠오른다. 동성애에 대한 루머가 무근거하고 무례하며, 다만 위험할 뿐이라는 소리다. 그러나 이 루머들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혐오세력은 놀랍게도 꿋꿋이 승리의 기억을 쌓고 있다.
최근 정부는 성소수자의 인권신장을 도모하는 공익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 각 처의 발언은 명대사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법무부는 성소수자의 인권이 편향적인 주제이기에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고, 서울시 복지정책과는 미풍양속을 운운하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했다.
성소수자가 어처구니없는 대우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민인권헌장과 관련한 공청회에 난입한 혐오세력은 인권활동가에게 폭력적 언행을 가하며 난동을 부려 행사를 파행에 치닫게 했다. 경찰은 그 상황을 손 놓고 구경만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헌장을 제정하는 일에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돌연 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인권헌장 제정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청 점거농성에 돌입한 인권활동가들이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게시하자, 경찰은 재빨리 이들을 저지했다.

혐오세력이 건네는 광고료가 독사과인 줄 모르고 넙죽 받아 그들의 확성기 노릇을 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도 만만찮다. 그 즈음, <한겨레>는 동성애 혐오성 광고를 전면에 실었다. 2013년에도 같은 잘못을 저질러 무수한 비난을 받고 사과를 한 바 있는데, 아무래도 진심은 아니었지 싶다.
다음날, <한겨레>는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토크콘서트에 벌어진 황산 테러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국사회가 견해의 차이에 증오범죄(hate crime, 혐오범죄)로 맞서는 지경에 치닫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 구구절절 옳은 문장들을 뽑아낸 <한겨레>의 날카로운 펜 끝은 한사코 바깥을 향한 게 아니었을까.
국민평등권 등 헌법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정신을 외면할 게 아니라면, 법무부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에 대해 ‘주제의 편향성’을 들먹였을까? 시민의 권리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를 원했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고한 시민이 혐오세력에게 시달리는 걸 방관한 경찰은 자기 인권이 곧 목숨이라는 시민의 외침을 묵살했다. 한겨레는 한 쪽 손으로 혐오와 폭력이 활개 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꼬집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의 씨앗을 뿌렸다.
치료해야 할 것은 동성애가 아니다
자신에게 숱한 결례를 범하고 성폭력적인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번번이 승리하는 걸 목도해 온 성소수자들. 이들이 고작 사랑하고 우정하며 사는 데에 무려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야 성소수자에게 이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과 애정을 가지라고 하는 건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가 아닐까.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양성애자 포샤는 “결국 내 마지막 비빌 구석은 한국인데, 이 배신감을 어떻게 표현하지? 되게 간절한데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된다”며, 이 일련의 사태에서 그녀가 느낀 감정을 토로했다. 혐오세력에게 승리를 선물하고 약속하는 것은 제 본분을 잊고 원칙을 공정하게 수행할 의지를 잃은, 눈 먼 권력이다.
우리는 동성애가 아니라 혐오로 찌푸려진 사회의 민낯을 치료하는 데에 천착해야 한다. 혐오세력이 성소수자에 대해 쏟아내는 루머와 이로 인해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가지는 숱한 오해의 해악성 못잖게 위험한 것은, 활개 치는 혐오로부터 무고한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권력과 원칙이 잠들었다는 사실이다.
마르틴 니묄러의 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만 이야기를 마친다.
그들이 내게 왔을 때는, 날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Als sie mich honten, gab es keinen mehr, der protestieren konnte.)
원문: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