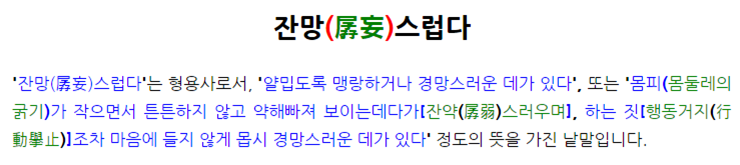이 소설을 읽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소설의 원제와 감상평을 남겨주신 분 중 30분을 추첨하여 라쉬반 SOS 키트를 드립니다.
1.
오늘도 또 우리 국방색 빤쓰가 막 쫓기었다. 이번에도 사각 빤쓰가 쌈을 붙여 놨을 것이다. 빠짝빠짝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나흘 전 그 건만 하더라도 국방색 빤스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너 혼자만 일하니, 일하기 좋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제 허리춤을 불쑥 들어올리더니, “느 허리엔 이거 없지?” 하고 명품 빤스만 갖고 있다는, 뜻도 모를 알파베또가 새겨진 밴드를 자랑하는 것이다.

2.
주인이 제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국방색 빤쓰는 깊은 구렁에 빠졌다. 철학을 배운 그는, 곡절을 흘려 보지 못했다. 군대는 제가 낸 신명이 아니라, 무쇠 같은 멍에가 다스리는 곳이었다.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미움과 앙갚음이었다. 그렇다고 자유를 찾아 사회를 택할 것인가? 그의 눈에는, 사회란 키에르케고르 선생 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 ‘여자친구’들의 광장인 것이었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국방색 빤스는 대답했다. “중립국.”
“동무,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소.”
“중립국.”

3.
그렇게 군대에 남지도 않고 사회로 나가지도 않은 채 서랍에서 살던 국방색 빤스를 사각 빤스가 명품 밴드를 걸고 있다며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색 빤스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가 예비했던 말을 마침내 꺼내었다.
“나도 닮은 것이 있어.”
“어디?”
“이 보게.”
그는 고무줄을 잡아당겨 이름이 주기된 태그를 가만히 꺼내어 놓았다. “이놈의 이름표 보게. 꼭 명품 밴드 아닌가. 닮았거든…” 나는 나의 얼굴로 날아오는 (의혹과 희망이 섞인) 그의 눈을 피하면서 돌아앉았다.

4.
하지만 사각 빤쓰의 전횡이란 것도 거기까지였다. ‘박제가 되어 버린 냄새를 아시오?’ 주인장의 사타구니에서는 겨울에도 축축하게 습진이 났다. 주인장이 하도 매일같이 승부 빤스니 뭐니 입고 다니니 각질과 악취가 섬유에 사무쳐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주인장은 한 달에 한 번도 빨래를 하지 않는다. 하물며 그가 나프탈렌인 줄만 알고 먹었던 약이 그냥 먹다 뱉은 박하사탕인 것을 딱 보아 버리고 정신을 놓고는 허구헌날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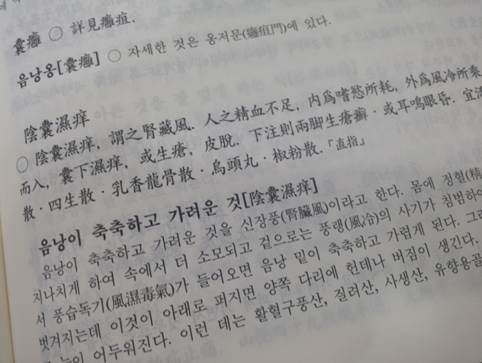
5.
결국 주인은 사각 빤스 대신 우리를 서랍 속에서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크고 아름다운 물건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크고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었다. 앙상한 몸체에 있어야 할 것만 겨우 달린 가시고추였다.
각질을 떨어뜨리며 와 내 섬유에 걸렸다. 나는 무서웠다. 건조해지다 못해 피까지 나는 사타구니가 수 천 수 만 줄기의 각질을 뿜어내며 덜렁거렸다. 각질이 몸에 닿을 때마다 나는 아픔 속에서 살려 달라고 외쳤다. 앞쪽 섬유에는 고약한 냄새가 와 닿았다.

6.
나는 그나마 나았지만, 이 년 동안 군대에서 찌들었던 국방색 빤스는 금세 위독해지고 말았다. “살아날 가능성은 – 글쎄 열에 하나 정도랄까?” 그의 상태를 진단한 의사는 말했다. 국방색 빤스는 수를 세기 시작했다. “구십 구만 스물 하나, 구십 구만 스물 둘.”
“너 지금 뭘 세는 거니?” 나는 국방색 빤쓰에게 물었다. “각질 말야. 내 섬유에 박힌 사타구니 각질이 이백 만 개를 채우면 드디어 나도 가는 거야. 오늘 또 하나 생겼구나.”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얘기는 하지도 마!”

7.
나는 국방색 빤스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국방색 빤스에게 말했다. “구라파 오스트리아의 빤쓰 대성당에는 루빤스의 대작 텐셀 빤스가 전시되어 있다고 해. 축축한 사타구니도 뽀송뽀송하게 해 준다는 그 작품을 볼 수만 있다면 너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
나는 겨울의 추위를 뚫고 루빤스의 작품을 보러 갔다. 그러나 루빤쓰의 대작 텐셀 빤쓰는 라이센스비가 있어 나같은 가난한 빤쓰에게는 관람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 설녀와 같은 추위가 우리를 냉혹하게 감싸안는 가운데, 나는 달빛의 은총이 어렴풋이 비친 텐셀 빤스를 눈에 안고 그만 죽음에 한없이 가까운 잠이 들었다.

“정신이 들었구나.” 그러나 다음날 아침, 나는 원인모를 포근함을 느끼며 다시 눈을 떴다. “나는 파트라쉬반이라고 한다. 루빤스의 작품에 대한 너의 열정을 느끼고 데려왔단다.” 나는 사타구니까지나 덮어야 정상일 내 기장이 무릎 위까지 길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 포근함이 나를 겨울의 추위에도 얼어죽지 않게 만들어 준 것이다.
“너의 정성에 감읍해 너를 텐셀 빤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단다.”
“하지만 루빤스의 작품은 아무에게나 관람이…” “괜찮다. 라이센스받았거든.”

8.
나는 기쁨을 안고 다시 집으로 달려가 호통을 쳤다.
“국방색 빤쓰야,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루빤스를 보고 왔는데 왜 일어나지를 못해.”
나는 국방색 빤스를 발로 찼지만 국방색 빤스는 일어나지를 않았다. 나는 그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 주기표를 껴들어 안아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년!” “…”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 말 끝에 목이 메어었다. 나는 닭똥 같은 눈물을 비벼대며 중얼거렸다.
“텐셀을 가져왔는데 왜 입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다더만…”

9.
다음날 국방색 빤스는 우리 곁을 떠났다. 장례식에 다녀온 아버지가 돌아와 말했다.
“말이 아니야, 대대에서 입었던 빤스가 이렇게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니…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써 봤다더군. 용감한 사내들도 이제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루빤스나 텐셀은 됐으니까 사각 빤쓰 놈을 같이 묻어 달라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