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읽은 감상: “플라톤은 정신병자인가…”
대학생 시절, 나는 교양에 탐닉했다. 분야를 막론하고 온갖 책들을 읽었다. 한번은 기왕 정치철학을 공부할 거, 원류에서부터 시작하겠답시고 플라톤의 『국가』를 꺼내 들었다.
대실수였다. 그 결과? 6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책을 완독한 후 내 머리에 남은 건 대충 이런 것들이었다. 이데아, 철인 정치, 그리고… ‘플라톤은 제정신이 아니다’ 정도? 『향연』도 읽었는데 더욱 심했다.
여자와의 사랑은 잘못된 거고, 남자와의 사랑은 찐인데, 성인 남성과 사랑하는 건 구리고, 소년이랑 사랑하는 게 찐이다… 이런 내용이 펼쳐진다.
경제도 마찬가지였다. 경제학의 원류이자 기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1,300페이지를 읽고 내게 남은 건 이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 그거 말고는 뭐, 애덤 스미스가 단순한 시장 만능 주의자는 아니었다는 것 정도…
무리해서 고전을 읽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이 책들은 하나같이 두껍고, 내용도 꼬여 있어 읽기가 쉽지 않다. 일부 번역본은 중역을 거쳐 문장이 극도로 번잡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그 생고생을 해서 얻은 것이라고는 ‘이데아’ ‘철인 정치’ ‘보이지 않는 손’ 같은 상식 수준의 지식. 내공 있는 연구자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인인 내게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이야기로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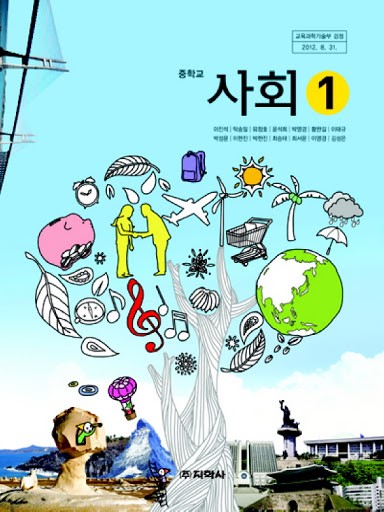
생각해보면 참 멍청한 짓을 했다. 그냥 ‘가오’를 위해 고전을 읽은 건 아니었다. 누가 씹어 먹여주는 지식이 아닌, 스스로 생각을 곱씹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식의 길잡이 없이 고전에 도전하는 건 무리였다. 사실 대학원 가면 1학기를 고전 1권에 할애하지 않나.
인문학 길잡이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종의 이정표가 필요하다. 폭넓은 교양을 효율적으로, 읽기 편한 문체로 전달해주는 책. 인문학 교양서들이 그것이다. 유시민의 『거꾸로 가는 세계사』, 이진경의 『철학과 굴뚝청소부』 등은 대학생들의 교양서로서 무척 오랫동안 사랑받았다.
하지만 이들 교양서는 10년, 또는 그 이상 이전의 교양서다. 어떤 학문이든 마찬가지지만, 인문학 교양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된다. 이정표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당장 이들 책에서, 최근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젠더 평등 문제를 읽을 수 있을까?
옛 책도 나름대로 오래된 지혜를 전달하지만, 그래도 새 시대에는 새 책이 필요한 법이다. 요즘에는 어떤 책이 인문학 교양서로서 사랑받을까. 2010년대 나온 대표적인 인문학 교양서라면 역시 딱 하나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대넓얕’,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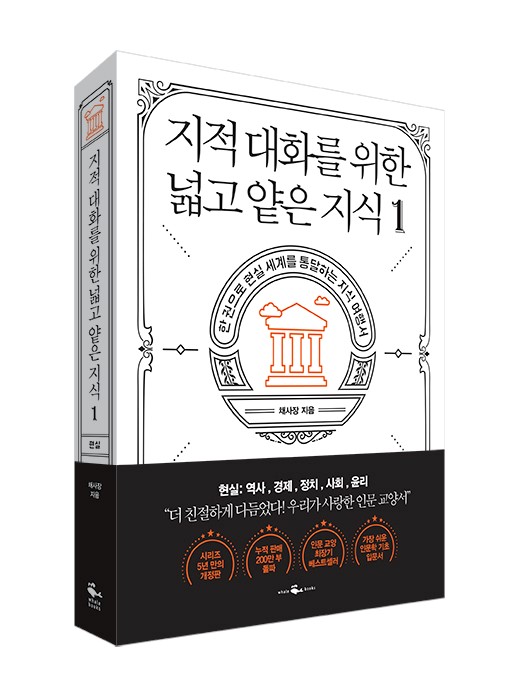
예스24 / 교보문고 / 알라딘 / 인터파크 / 네이버 책
2015년 출간된 이 시리즈는 출간 1년 6개월 만에 누적 100만 부 판매를 돌파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죽은 줄 알았던(?) 인문학 교양의 숨을 다시 틔운 일등 공신이 되었다. TvN의 『알쓸신잡』이 여기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인문학에 관심만 있었다면 치트키처럼 접근해보자
이 책은 어찌 그리도 많이 팔렸을까? 단연 친절함이다. 책이 나오기 전 저자는 팟캐스트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듯 말발이 끝내준다(…) 책에서는 구어체를 쓰진 않지만, 문어체로 쓰였음에도 독자에게 저자가 끊임없이 ‘말을 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술술 읽힌다.
다른 교양서들도 쉽고 재밌게 쓰려 노력했지만, ‘지대넓얕’의 달변에 비교하자면 서툰 눌변으로 느껴질 정도다. 중간중간 등장하는 우화(?)는 어려운 인문학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래의 이야기는 자본주의 초기 선진국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 대해 묘사한, 지대넓얕 속 우화의 한 사례다.
“소 한 마리당 구두 다섯 켤레로 하자.”
“나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소에게는 우리 선조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B가 준비해온 권총을 뽑아서 원주민 한 명을 쐈다.
“소 한 마리당 일곱 켤레로 하시죠.”
시장이 개척되었다.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복잡한 현실을 너무 단순화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탁월하다. 책의 콘셉트처럼, ‘넓고 얕은’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최적의 수단인 셈이다. 이 책은 그런 우화를 무척이나 자유자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인문학을 웹 소설만큼 쉽게 읽히게 만들어준다.
역사로부터 경제로, 정치와 사회, 윤리까지 커버하는 교양 입문서
이 책은 역사에서 시작해 경제, 그리고 정치로 진행된다. 『지대넓얕』이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걸 다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 책만 읽으면 아주 그럭저럭 역사, 경제, 정치, 사회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지점을 저자라고 모르지 않는다. 『지대넓얕』 초판이 나왔던 2015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얕은 지식’이라는 제목이 싫어 고민했다. (…) 1권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경제체제와 연결한 것에 대한 비판을 예상했지만, 대신 ‘얕다’는 비판만 있더라. ‘아 아무도 안 읽는구나’ 싶었다.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게 있을까? 쉬운 것과 얕음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지대넓얕』 같은 교양서를 읽는다는 건 모든 걸 알고 체득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이정표일 뿐이다. 길을 잃고 헤매지 않기 위한 일종의 마인드맵이다. 우리는 이 책의 견해를 접하고 역사, 경제, 정치의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과 동시에, 오히려 이 책을 비판하고, 또 현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와 연결 지을 수 있다.

교과서를 달달 외우지 말고, ‘지적 대화’를 시작해보자
교양서는 100점짜리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다. 당연하다. 플라톤의 ‘국가’는 600페이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1,300페이지 책이다. 교양서가 보이지 않는 손 얘기만 1,300페이지에 걸쳐 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이 책은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예로 『지대넓얕』은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공급과잉을 일으키며, 전쟁은 공급과잉의 문제를 단번에 해소하고 막대한 부를 창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쟁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이론은 그로 인한 인프라, 인적 자원, 자산 등의 파괴를 도외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보수와 진보를 단순히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로 나눈다는 것도 이상하다. 예를 들어 여성과 성 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애플 CEO 팀 쿡 같은 인물을 단지 대기업 경영자라는 이유로 ‘보수’로만 정의할 수 있을까.

한국 최고의 인문학 베스트셀러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게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말하는 ‘지적 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책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경전’이 아니다. 끊임없이 저자와 ‘대화’를 나누며 생각을 가다듬는 과정이다.
앞서 말했듯 채사장 역시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 아마 당신도 나처럼 고전에 한 번쯤은 도전해봤을 것이다. 그리고 극히 일부가 아닌 한 자신의 얕음만 인식하고 책을 덮었을 것이다. 『지대넓얕』은 최소한, 단순한 도식화라는 문제가 있지만 책을 덮지는 않게 만든다. 쉽고 재미있으니까.
우리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제대로 했을 리가 없다. 그냥 자주 듣는 말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을 것이다.
인문학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쉽고 익숙한 데에서 시작하는 게 낫다. 일단 시작했다면 이후 더 깊은 정보들은 다른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말을 배워 지금처럼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게 됐듯, 『지대넓얕』을 통해 인문학에 접근해 보자. 그 이후는 당신의 호기심이 채워줄 것이니.

※ 해당 기사는 웨일북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