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명지대 앞에 갔다가 길거리에 검은색 애벌레들이 잔뜩 넘쳐나는 걸 봤다.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학생들이 전부 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었다.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는 몰개성이 갑갑해서 좀 다르게 입고 싶은 학생도 더러 있을 텐데, 혹시 그랬다간 왜 튀느냐고 한 소리 들으려나. 스스로 선택한 패션이라고 하더라도 참 한국은 불가사의함이 변하지 않는구나 싶다.

근래 정시니 수시니로 말들이 많다. 뭐가 더 옳고 뭐가 더 그르다 하며 격론이 오간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대학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 중에 가성비가 가장 높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주장일 뿐이다.
어떤 특정한 방식이 더 공정하다거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말들 하지만, 어차피 모두가 공교육의 목적을 대학 입학으로 생각하는 이상 무슨 방법을 선택하든 계급 배경의 차이에 따른 성과의 차이는 반드시 생겨난다. 즉 정시를 하든 수시를 하든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학부모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가령 대입이 목적인 이런 교육환경에선 대입 전형에 독서를 넣든 안 넣든 책은 성과를 위한 도구로 기능하게 된다. 결국 현실에서 독서가 깊이 있는 사고로 이어지는 건 부차적인 문제일 뿐으로, 독서를 통한 사유 능력의 신장은 학생의 선천적 지능이나 부모의 직업 및 책을 대하는 태도가 만들어내는 가정환경에 크게 좌우된다. 사실상 대입 사전기관으로 운영되는 공교육 학교의 일선 교사들에게 그 간극을 메워달라고 떠미는 건 비현실적인 요구다.
우리 사회에서 책을 가까이하며 온전히 먹고 살 수 있는 이들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 또는 경제적 수준의 보편적인 양상을 볼 때, 이는 상대적으로 돈이 적고 배운 게 덜한 부모 일반에게 불온한 감정을 선사하기 딱 좋다. 먹고 살기 바쁜 보통의 부모들은 없는 살림에 돈을 쪼개서 헌책이라도 왕창 사 안겨야, 그나마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한 기본적인 뒷바라지라도 하는 거 아닌가 하며 불안을 털어낼 수 있다. 그마저도 안 되는 생활 수준을 가진 부모들은 일찌감치 모종의 미래를 포기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작더라도 아파트나 빌라에 살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감지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 돈을 댈 여력이라든가 본을 보일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는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위해 독서를 비롯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주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모르는 길을 간다. 그리곤 가슴을 치며 입시제도가 부익부 빈익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지식의 하위계급으로부터 다소라도 떨어진 다른 학부모, 교사,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공교육이 해야 할 이상적인 일을 모르는 무식한 하소연쯤으로나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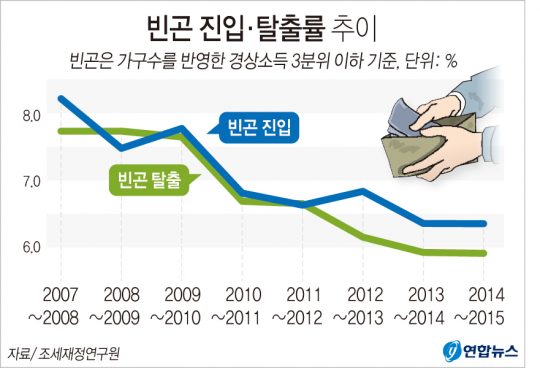
책을 읽는 것이 안 읽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많은 장점을 벼리게 해주고 더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게 맞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읽고 어떤 시각으로 사고할 것인가 가르치는 게 공교육의 주요한 임무라고 본다면, 또한 그럼에도 독서가 대입을 위한 도구로 작용한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독서를 대입 전형에 포함시키고 말고 하는 문제의 진짜 본질은 대입 정책이라는 그럴듯한 당위를 핑계 삼아 관계자 모두가 사유의 훈련을 제도에 떠넘기고 뒷짐 지는 형국임을 부정해선 안 된다.
독서량 많고 논리적 서술에는 능한데 인격에 있어선 기준 미달인 이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는지 현실을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 입시 논란의 층위에서만 독서량의 경중을 논하는 건 코미디에 가깝다. 지금과 같은 사회 구조적 상황에선 대입에 책을 끼워 넣든 빼든, 아니 다른 무엇을 넣거나 빼도 사회가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의 답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대입제도 문제의 시원은 대학 졸업장과 학벌이 이후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다. 즉 사회구조가 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떠받치는가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전히 못 찾는다. 대학 입시는 이 사안으로부터 영향을 강하게 받는 하위에 있으므로 해서 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를 모두가 알면서도 어떤 전형이 더 공정하고, 더 민주적이며, 더 학생을 위하고, 더 학부모를 위한 것이다 단언하고 갑론을박하는 건 지엽적인 문제로 큰 문제를 가리느라 어른들끼리 벌이는 거대한 사기 쇼에 가깝다. 물론 맹점 있는 현실 속에서 뭐라도 해보자는 시도는 다 의미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취지라면 우리 공교육이 대입 구조의 원형질인 사회 구조적 양상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진지함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길거리의 아이들이 왜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싶은지, 왜 그렇게 다 똑같이 입는지, 다른 옷으로는 어떤 걸 입고 싶은지 등 사회는 그런 사소한 것조차 관심 두고 묻거나 그들과 함께 토론하지 않는다. 만약 토론한다면 그것조차 대입과 관련한 토론프로그램에서나 간신히 스쳐 갈 것이다. 학생들과 같이 살지만 정작 대화상대로는 배제하는 사회다.

사회의 기축을 담당하는 어른들은 학생들과 토론으로써 서로의 사유를 교환하지 않는다. 그건 어른들끼리도 서로의 사유를 교환하지 않는 태도와 습관 그대로의 반영이다. 노키즈존으로 말 많은 사회답게 노썸원존의 나라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미래에 독서가 포함되네 안 되네, 정시가 옳네 그르네 백날 이야기해 봤자 영원히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면에선 파렴치하다.
굳이 쓴소리를 더 하자면, 내 눈엔 학생들을 위한다며 진짜 문제는 제쳐 두고 대입 제도에만 핏대부터 올리는 교육관계자들 거개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사기꾼으로만 보인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속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