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의 덕심: 끝을 보자!
번역자의 덕심이란 무릇, 원본에 더 가까이 가려는 사랑을 일컫는 별칭이다. 잉여처럼 보이든 말든 끝까지 가 보고야 마는 고리타분한 성실함이야말로 우리 번역자들이 글을 쓸 때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우리가 고래잡이에 관한 글을 한 편 쓴다고 가정하자. 덕심이 불순한 1단계에서 덕심이 충만한 6단계까지 분류해 보았다.
- 1단계: 카페베네에 감. 주문하신 카라멜마끼아또 나오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고래잡이’ 입력
- 2단계: 도서관에 가서 고래잡이에 관한 자료 열람
- 3단계: 고래 전문가 인터뷰, 고래박물관 탐방
- 4단계: 포경선 견학
- 5단계: 고래잡이 선원들과 술친구
- 6단계: 포경선에 취업, 거친 바다로

여러분의 덕심은 어느 단계인가? 허먼 멜빌의 덕심은 6단계까지 갔다. 에밀 졸라나 조지 오웰도 그랬다. 눈보라 치는 바다 풍경을 화폭에 옮기려고 자기 몸을 돛대에 묶고 폭풍이 몰려오는 바다로 나간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의 오덕스러움도 6단계다. 『광장』 초판 원고를 무려 10번이나 고쳐서 개정판을 낸 작가 최인훈의 덕심도 그에 못지않다. 자기 글의 모든 문장, 모든 단어, 모든 글자에 떳떳해지고자 하는 예술가의 끝없는 자기 성찰.
나는 『번역자를 위한 우리말 공부』를 쓰면서 국어연구자 이성복이 지은 『한국어 맛이 나는 쉬운 문장』을 많이 참조했다. 이 책 285쪽에 “한글 2002가 빨간 줄을 잘못 표시하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2002’에서 오줌을 지릴 뻔했다.

그냥 ‘아래한글 프로그램 자동맞춤법 오류’라고 써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양반은 버전 정보까지 표시했다. 이분은 한글 2002 버전으로 저 자료를 정리했기에 곧이곧대로 그렇게 적었으리라. 이 고루하고 깐깐한 책임감을 보라. 이게 맞다. 원본 정보를 향한 무한한 애정과 겸손한 책임 한계 설정, 우리 번역자들은 이런 덕심을 배워야 한다.
작은 실천: 메모 덕후가 되자
나는 메모 덕후다. 메모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글을 잘 쓴다는 보장은 없지만, 잘 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기록해 둔다. 책상 위에 화이트보드가 있고 책상 옆에 분필로 적는 A자 칠판을 세워 두었다. 걷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며 생각이 떠오를 때를 대비해 주머니에 포스트잇과 작은 볼펜을 넣고 다닌다.
운전하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메모하기가 참 난감한데, 이럴 때 암기를 시도한 적도 있으나 내용을 잘 외웠다 해도 자기가 뭔가 외웠다는 사실을 아예 까먹으면 낭패이므로 문자로 적는 게 가장 안전하다. 갓길에 차를 잠시 세우고 메모를 남긴 다음 다시 출발하기도 했는데 위험하더라. 그래서 잡생각이 많이 들 때는 신호등이 많은 경로나 막히는 길을 일부러 택하기도 한다.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에 소니 녹음기를 든 채 육성 메모를 남긴 적도 있지만 번거롭고 위험하여 접었다.
차량용 수첩은 스프링이 달린 큼직한 게 찢기도 편해서 좋고 펜은 똑딱이가 좋다. 뚜껑 달린 거 위험하다. 뚜껑 빼다가 자칫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에 감사하고 따끈따끈한 메모로 그 덕심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글 한 줄 쓰려고 머리를 쥐어짜야 하는 형벌이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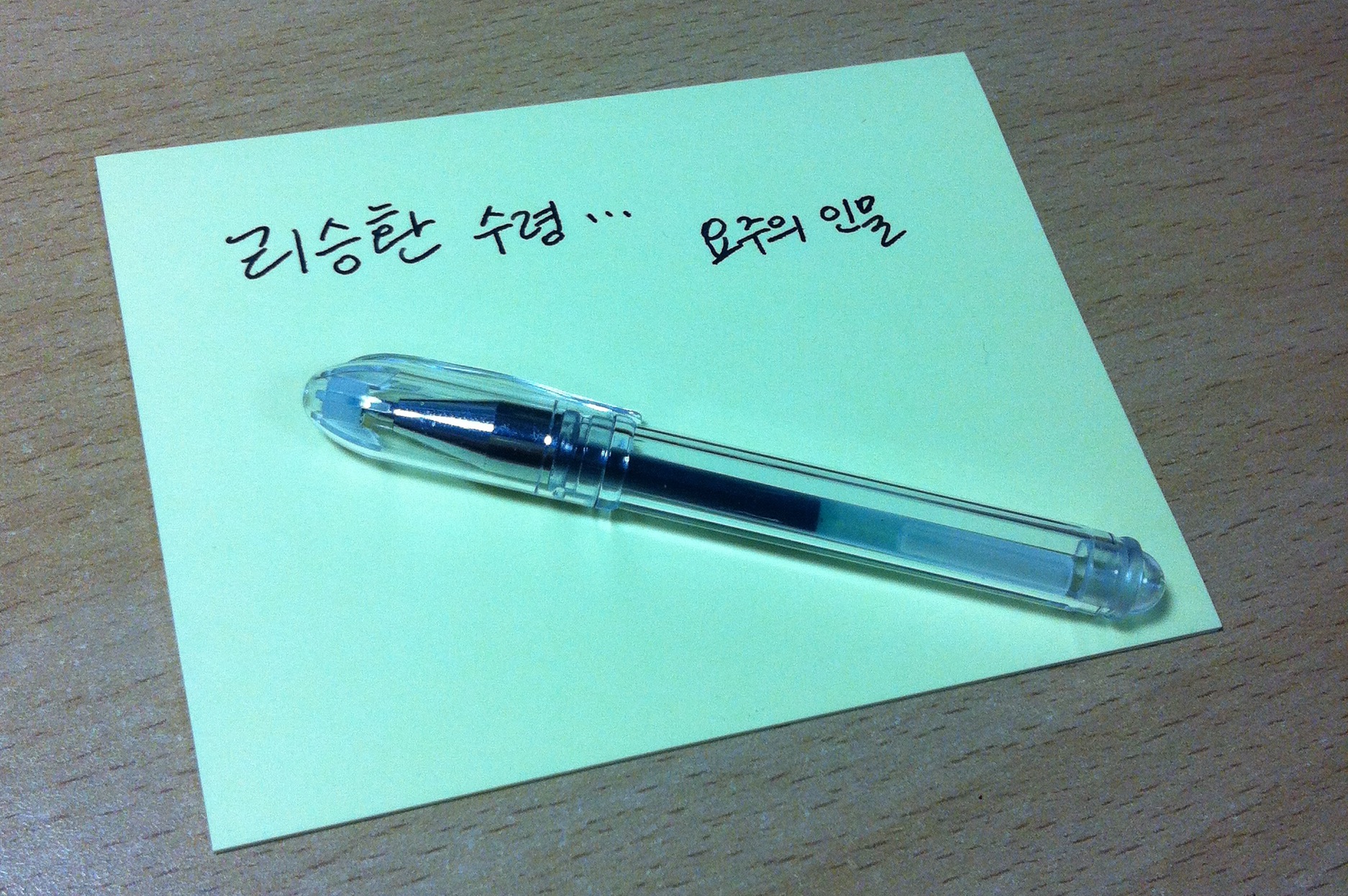
메모를 향한 덕심을 표현하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파주에서 고양을 거쳐 서울로 가려면 수색로를 지나는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뒤엉켜 있는 이 길을 버스로 지나다 보면 메모할 꺼리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나는 도중에 일단 내려서 사진을 찍거나 문자로 자세히 기록한 다음, 다음에 오는 버스를 탄다. 같은 노선 버스를 다시 타면 환승 할인이 안 되지만 정보 수집 비용이라 여기면 발품과 시간과 돈이 별로 아깝지 않다.
어느 날 안국역에 가는데, 가판대 옆을 지나다가 주인 할아버지가 열 손가락을 쫙 펴며 외국인 손님에게 커다란 소리로 “만 원이요”라고 외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나는 이 장면이 귀여웠다. 가판대에서 파는 물건들은 대개 천 원 단위이니 할아버지는 평소에 손가락 하나나 두 개를 펴서 손님에게 값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가판대에 무려 일만 원짜리 상품이 들어왔는데 할아버지는 검지 하나만 펴서 만원이라고 표현할 준비가 안 됐던 것 같다. 개찰구를 나가서 까먹기 전에 메모해 두었다.
안국역 가판대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이 물건값이 얼마냐고 묻자 열 손가락을 쫙 펴며 ‘만 원이요’라고 답하는 주인 할아버지의 모습이 무척 귀여웠다.
3번 출구를 향해 가다가 문득 메모를 향한 내 덕심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메모는 모름지기 철저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거늘… 삑, 1050원을 다시 찍고 가판대로 돌아갔다. 다행히 아까 그 외국인도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다.
“저, 저기요, 왜라유프럼?”
“저, 어르신, 아까 ‘만 원이요’한 게 뭐예요?”
메모를 이렇게 다듬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가판대에서 터키에서 온 남자가 북촌한옥마을 엽서집을 가리키면서 얼마냐고 묻자, 열 손가락을 쫙 펴며 ‘만 원이요’라고 답하는 주인 할아버지의 모습이 무척 귀여웠다. 엽서 가격은 한 장에 천 원, 열 장 묶음에 만 원이다. 가격 참 정직하다.
원본을 향한 기본: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라
역사 연구자인 박수철은 자신을 지도한 교수에 얽힌 이야기를 이렇게 회고했다.
교토 대학은 일개 사학과 도서관도 2명의 전문 관리 사서를 따로 둘 정도로 막대한 분량의 서적과 자료를 갖고 있었다. 당초 논문을 쓴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논지를 세우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때 생각이 조금 변하여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상을 ‘복원’하는 일이 보다 어렵고 중요한 작업임을 깨달았다. 가장 신기했던 경험은 사료를 읽어나가면서 중간에 애매한 부분이 나오면,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지도교수의 자세였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기.
그러나 이는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모든 연구 성과와 자료를 섭렵한 위에서 하는 발언이라 무게감을 느꼈다. ‘모른다’는 말을 들은 순간 도리어 극복해야 할 대상이 분명하고 뚜렷해지는 묘한 경험을 하였다.
- 박수철, 『오다·도요토미 정권의 사사 지배와 천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쪽.
원본에 가장 가까이 가 본 사람은 모르는 것에 관해 겸손하게 모른다고 말한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원본에 가까이 갈 생각을 아예 품지 않는 카페베네 필자들은 무식을 감추려고 온갖 수식과 난삽한 표현으로 문장을 떡칠한다. 지가 모르는 게 뭔지 똥오줌 못 가린다.
덕심은 아름답다. 짝퉁을 가려내려는 심미안, 훌륭한 한정판을 소유하려는 욕망, 진짜를 대면하여 그 가치를 충분히 음미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최상급 횡성한우를 맛본 사람은 미국산 중에서도 괜찮은 걸 잘 가려낸다. 최상급 고전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무수하게 쏟아지는 신간 중에서 썩 괜찮은 것을 가려낸다. 고급 번역가는 다른 이가 번역한 글에 오역이 보이면 잘 정리하여 번역자에게 넌지시 알려주지 트위터나 페북에 지껄이지 않는다.
원래 맥락을 존중하는 태도, 정확한 출처를 향한 몰두, 좋은 대본을 향한 존경, 동료 번역자를 향한 애정, 무엇보다 다른 두 언어를 연결하는 문화 전달자로서 품어야 할 자긍심. 나는 내 책을 읽은 번역자들에게서 이런 덕심들이 우러나기를 기도한다. 『번역자를 위한 우리말 공부』를 쓰면서 나 역시 그 덕심을 잃지 않으려 조심했고 또 애를 많이 썼다. 책 한 권 사달라는 이야기를 너무 돌려 말한 것 같다. 한 문장 한 문장 공들여 지었으니, 꼭 사서 읽어 주시기 바란다. 꾸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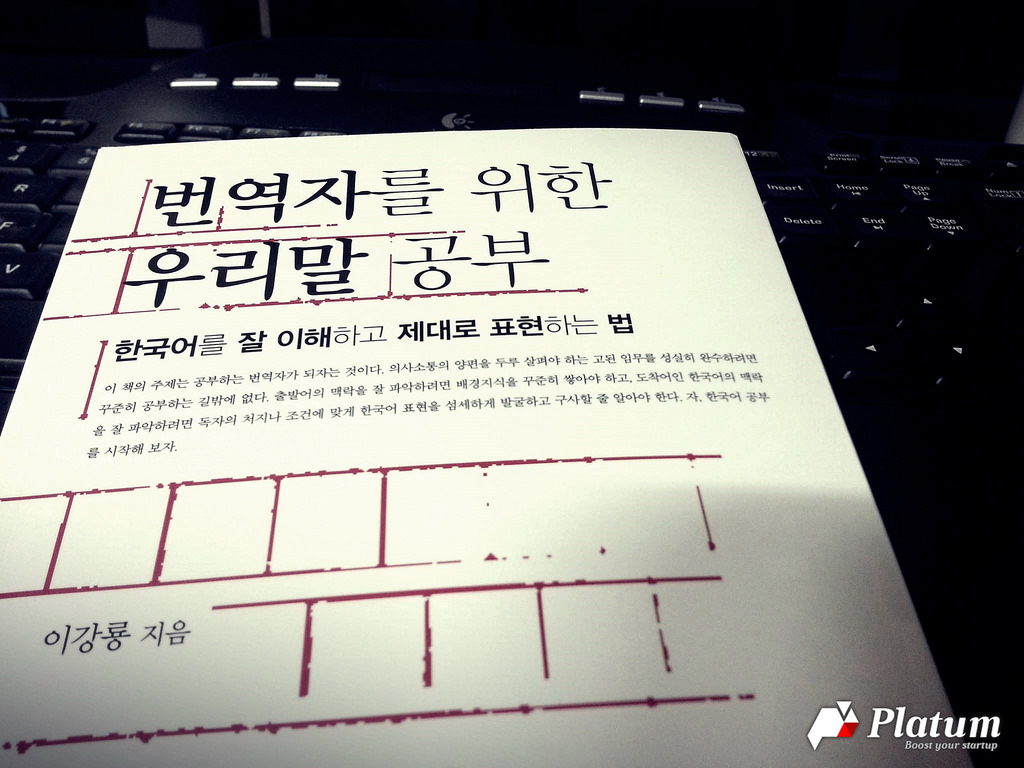
valentino shoesHow to Get Kirsten Dun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