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은 정시·논술 등 다른 학생 선발 방식에 비해 일반고, 서울-경기 외 지방, 저소득층 등에게 유리합니다. 학종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29%로 정시(21.3%)와 논술(19.8%)에 비해 크게 높고, 일반고 출신 역시 74.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 상위 5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출신이 정시에선 66%에 달했으나 학종에선 46%로 낮아졌다는 통계도 있지요. 이는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란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수능에 비해서도 오히려 ‘진보적’인 학생 선발 방식이라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이 정부가 각 대학에 정시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지식인 사회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교육제도에 자꾸 손을 대는 게 썩 좋은 일도 아니고요.
사실 놀라운 결과는 아닙니다. 학종은 원래 이렇게 설계된 제도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교과 부문, 수시의 원형이기도 했던 내신을 보면 학교별로 내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 몰려있는 학교일수록 오히려 불리해지는 데가 있죠. 그러다 보니 학종에선 이를 암암리에 보정(?)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어쨌든.
학종에 대한 불신이 기원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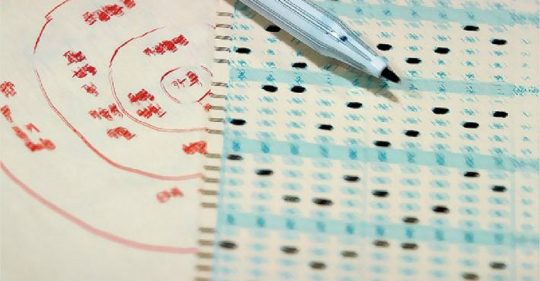
평등이란 기계적인 평등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반, 조건이 다른데 출발선만 같게 해준다고 해서 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 이슈가 되는 성 평등 문제가 그렇고, 장애인 고용, 복지 정책 등은 당연한 과업이고요(잘 되는 것 같진 않지만).
가난이 개인의 발전에 얼마나 큰 족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뤄지죠.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종(을 포함한 수시 전형)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런 ‘적극적인 불평등 교정’을 위한 여러 장치가 숨겨진 것 같아요.
일견 불공정해 보이는 내신 평가 방식 같은 게 그렇죠. 학업능력으로 줄을 세우는 대신 여러 분야에서의 성취, 창의적 활동 등을 입시에 반영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 덕분에 저소득층, 일반고, 서울-경기 외 지방의 학생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적인 불평등을 교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그러다가 일차적인 평등이 망가져 버렸다면 어떨까요?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규칙에 따라 경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평등의 운동장 말이죠. 학종이 정말 그런 운동장을 깔아주고 있을까요?
학종에 대한 일반 대중, 학생들의 불신은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교과 영역이야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 생활기록부나 교사 추천서 같은 거요. 뭐 자소서야 소서가 아니라 소설이란 얘기가 당연한 격언(?)처럼 여겨지지만, 학종도 정말 소설을 쓴다는 얘기가 공공연하죠. 학생부를 학생이 직접 쓴다거나 허위 내용을 집어넣는다거나 하는…

경향신문에 실렸던 「위선의 입시, 학종」이란 기사는 이런 현실을 날것으로 보여줘요. 학생부에 쓸 스펙을 사실상 ‘기획’해서 만들어주거나, 학원에서 쓴 학생부를 그대로 써준다거나, 자기소개서를 학원에서 만들어준다거나… 학교가 성적우수자에게 스펙을 ‘몰아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일선 학교에서는 고 1, 2 때 공부를 못 했던 학생이 고 2, 3 때가 되어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싫어한다고 해요. 이 학생이 고 1, 2 때부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아이의 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뒤늦게 성취를 보인 학생이 대신 좋은 학교에 가느냐면 그것도 아닌 것이 이미 1, 2학년 때의 성취가 별로 안 좋았다 보니 고 2, 3 때 암만 잘해봐야 결과값은 어중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아예 대놓고 비리까지 끼어드는 거죠.
평가 방식이 주관적이다 보니 아예 인맥으로 학생을 뽑는 대놓고 입시 비리가 벌어지기도 쉽고요. 교과 영역도… 이번 A고등학교 교무부장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 같은 게 또 어디서 벌어졌을지 몰라요. 어쩌면 학종의 썩은 줄기에서 가지 하나가 너무 멀리 뻗어져 나온 것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시스템에 대한 불신
불신. 여기에는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어요. 최소한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거예요. A고등학교 사태가 터져 나온 데서 볼 수 있듯, 그 의심에는 충분한 경험적 근거가 있고요.

수능은 무척 불공평한 입시제도죠. 서울-경기 등 정보에 가까운 지역에 유리하고, 그중에서도 강남 등 교육 특구에 유리하고요. 당연히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특목고에 유리하고 사립고에 유리해요. 사교육에 유리하고요.
하지만 수능은 아주 공평한 입시 제도에요. 학계 권위자들이 고교생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수준 높은 문제들로 학생의 실제 수학능력을 아주 객관적으로 측정하죠. 괜히 ‘수학능력’ 평가가 아니거든요. 사실 내신 문제와 수능 문제의 질적 차이는 커요. 줄 세우기라고 욕은 많이 먹지만, 수학능력을 측정하기엔 내신보다 훨씬 좋은 도구일 거예요.
슬로 스타터에게도 지금 나의 학업 능력만을 순수하게 측정받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요. 국가 수준의 엄중한 보안 관리를 거치며 문제가 있으면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소송까지 벌어지지요. 어떤 측면에서는, 아니, 생각보다 많은 측면에서 차라리 수능이 더 공평한 입시 제도일 수 있는 거예요.
교육제도 얘기에는 좀 사족 같지만
조금 이야기를 덧붙여보면,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교정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좀 더 불리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은 조금 더 앞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실질적인 의미의 평등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운동장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온통 자갈밭에 랜덤으로 함정을 깔아놓고, 출발이 늦으면 갑자기 심판이 난입해 선수를 방해하고(…) 사실 이렇게 해도 불평등은 교정되긴 할 거예요. 복불복이니까. 죽창 앞에선 너도 한방 나도 한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평등하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최근 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섰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했죠. 이에 대해 지식인들은 ‘정규직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안달한다’고 규탄했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지역 관공서의 계약직 직원들은 정말 쪼개기 계약으로 고통받는 약자들도 있지만 어디선가 누군가의 인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하는 일도 없이 예산을 축낸다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었죠.

시스템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인 기계적 공평함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위에서 불평등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교정한다는 건 오히려 공평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는 그 기본인 기계적 공평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왔고요. 그러니 젊은이들은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인 우대 조치’, 말은 좋지. 그런데 그 전에 ‘기계적인 공평성’이나 제대로 갖추든가.
젊은 세대의 소위 ‘무임승차’에 대한 혐오,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요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기성세대 사이에서 젊은 세대가 우경화된다는 우려가 높아지지만, 전 그걸 단순히 우경화로 이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문: 임예인의 페이스북
